실시간 뉴스
- 정우성, 입장 거부 굴욕…“현빈과 간다니 바로 가능” (전참시)
- "슈퍼, 슈우우우퍼 스킬" 해설위원도 감탄한 안세영, 부상 투혼 끝에 배드민턴 새 역사
- 위성우 감독 “5~6연승은 큰 욕심인 것 같다…하나은행이 이기려는 의지 더 컸어” [IS 패장]
- BTS RM “하이브, 우리에게 애정 가져달라” ‘해체’ 언급 후 작심 발언 [왓IS]
- '이제 열 손가락도 모자라' 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94.8%, 안세영 적수가 없다
- [속보] 'G.O.A.T' 안세영, 왕즈이 꺾고 '왕중왕전' 우승…여자 단식 최초 '시즌 11승' 신기록
- 조세호, 함께 혹한기 버텼는데…‘4관왕’ 1박 2일, 가장 힘들었던 순간 [TVis]
- 값진 1승에, 신인 더블더블까지…양동근 감독 "건하? 주눅 드는 게 없다" [IS 승장]
- ‘하차’ 조세호, ‘1박 2일’ 無편집…“김종민 ‘연예대상’ 축하무대 대단” 너스레 [TVis]
- 연패 끊은 이상범 감독 “선수들이 수비 잘했고, 운도 많이 따랐다” [IS 승장]
무비위크
[인터뷰②] 김혜수 "연기 잘하는 이정은, 동경해"
등록2020.11.16 08:00

온통 아름답다. 영화도, 미모도, 미담도 여전히 배우 김혜수(50)답다.
김혜수의 새 영화 '내가 죽던 날'은 절벽 위에서 한 소녀가 사라지고 소녀의 행방을 쫓는 현수(김혜수)의 이야기를 그린다. 추리물의 외양을 썼지만, 추리물이 아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는 드라마 장르의 작품이다. 주인공 현수 역을 맡은 김혜수는 별달리 큰 사건이 없는 이 영화의 서사를 홀로 꿋꿋하게 이끌어나간다. 커다란 눈부터 좌절과 체념 사이의 걸음걸이까지, 섬세한 표현으로 감정 연기를 펼친다.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그는 극장을 나가는 관객의 마음까지 아름답게 만든다.
투자가 잘 되지 않았던 이 영화의 진가를 알아본 이가 김혜수다. 그 덕분에 투자를 받아 하나의 영화가 완성될 수 있었다. 이토록 이 영화에 애정을 담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이 이 영화를 찍으며 상처를 치유했듯, 관객 또한 그러길 바랐다고. 상처를 남겼던 개인사까지 먼저 털어놓은 그는 "이런 영화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작품에서 김혜수가 더 보인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정말 잘 뭘 몰랐던 것 같다. 또래 나이에 비해 많이 미숙했다. 그게 늘 컴플렉스이기도 했다. 어릴 때 데뷔하다보니 어른에 대한 동경의 시선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어른을) 흉내냈다. 근데 대중은 뭐가 진짜고 아닌지 다 안다. 난 몰랐다. 열심히 했는데 몰라준다고 생각했다. 배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소스가 단조로웠다. 배우를 하기엔 너무 갖춰져있는 게 없었다. 미숙했다. 배우가 배우로서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게 나에겐 큰 숙제였다. 정말 해내고 싶었다. 그냥 영화 속 인물이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까지 계속 알아가고 있다.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물론 있다. 근데 내가 캐릭터를 매개로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솔직할 수 있는지가 큰 관건이다. 이 영화가, 이 캐릭터가 가장 군더더기 없다. 내가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는지 잘 드러내주는 캐릭터다. 내가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는지, 테크니컬한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이 영화가 김혜수의 대표작이 될까.
"나는 대표작이 뭐라고 이야기한 적 없고, 뭔지도 모르겠다. 이번 작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타짜'를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건 영화를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그건 최동훈 감독 작품 속 김혜수다. 그런데 이건 박지완 감독 작품 속 김혜수는 아니다. 근데 또 대표작이라고 하면 그건 모르겠다. 보시는 분들이 대표작을 정해주시면 된다. 아니어도 상관없다. 오래 연기한다고 해서 꼭 대표작이 생겨야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정은과의 호흡은 어땠나.
"이정은은 나보다 어른 같다. 인격적으로도 훨씬 어른 같다. 나는 기본적으로 연기 잘하면 어른 같다.(웃음) 연기를 정말 잘한다. 나에겐 약간 신기루 같은 사람이다. 카메라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해질 수 있느냐는, 내가 담대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다. 그에 대한 동경이 있다. 배우로서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번 작품에서 이정은 같은 사람을 알게된 것, 마음을 가까이 얻은 것이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김선영이라는 배우를 만난 것도 못지않다. 정말 좋은 배우더라."
-영화계 어른이 됐는데, 책임감을 느끼나.
"나는 누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압박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나를 가까이 보는 분들은 알 거다. '그냥 철없구나'라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다. 언론에서 나의 좋은 것들만 어필하는 거다.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지만 책임감을 갖고 부담을 갖지는 않는다. 그냥 마음 가는 데로 한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충무로 대표 여성 영화인으로서 변화를 실감하나.
"박지완 감독의 시나리오를 받을 때쯤 나에게 들어온 시나리오 60% 이상이 여성 신인감독의 작품이었다. 솔직히 '웬일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연을 고민했던 작품이 두 개 더 있었다. 남성이 남성 캐릭터를 조금 더 당연히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여성이 주체가 되는 캐릭터는 당연히 여성이기 때문에 덜 노력해도 조금 더 잘 그려낼 수 있는 것 같다. 스케줄 문제로 다른 작품은 선택을 못했지만 괜히 기분이 좋았다. 당차고 똘똘한 제대로 하는 감독이 많아졌으면 좋겟다. 이건 남녀 불문이다. 각오 이상의 것들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내가 이 작품을 하게 됨과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이 작품의 실패가 새로운 신인들에게 주는 영향, 기회를 빼앗는 압박감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자 감독이라서 기분 좋게 칭찬하는 건 없다. 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하는 거다. 각오는 '이 정도면 된다'가 아니다. 현장은 전쟁터다. 120% 준비가 완료돼도 반드시 변수가 있다. 그 변수까지도 컨트롤하는 게 감독이 할 일이다. 감독은 신인이고 베테랑이고 없다. 감독은 감독이다. 현장에서는 선장이다. 나는 너무너무 영화를 사랑한다. 제대로 준비된 감독들이 많아져야 하고, 그런 감독이 제대로 지독하게 처절하게 맘껏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있어야 한다. 영화의 장르나 규모를 떠나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 평가가 왜곡되면 안 된다."
>>[인터뷰③] 에서 계속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사진=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강영호 작가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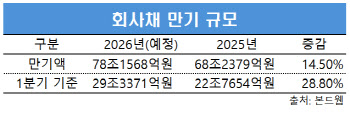
![[AI헬스케어] 정부 주도 AI의료 기술 개발...닥터앤서3.0 참여 기업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2100690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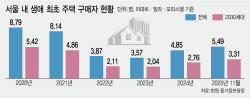









![[포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故 윤석화 빈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86.400x280.0.jpg)
![[포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故 윤석화 빈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84.400x280.0.jpg)
![[포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故 윤석화 빈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85.400x280.0.jpg)
![[포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故 윤석화 빈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87.400x280.0.jpg)
![[포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故 윤석화 빈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81.400x280.0.jpg)
![[포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故 윤석화 빈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83.400x280.0.jpg)
![[포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故 윤석화 빈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82.400x280.0.jpg)
![[포토] 연극 '더 드레서' 선생님 역 정동환·박근형](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79.400x280.0.jpg)
![[포토] 연극 '더 드레서' 노먼 역 맡은 오만석·송승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77.400x280.0.jpg)
![[포토] 연극 '더 드레서' 사모님 역맡은 송옥숙·정재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76.400x280.0.jpg)
![[포토] 연극 '더 드레서'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80.400x280.0.jpg)
![[포토] 연극 '더 드레서'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19/isp20251219000078.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