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아이파크가 K리그2 우승과 K리그1 다이렉트 승격 기회를 모두 놓쳤다. 이기면 자력으로 모든 걸 품을 수 있었지만, 충북청주와의 최종전에서 무승부에 그치면서 2위 김천 상무에 모든 걸 내줬다. 우승과 승격을 통해 앞선 굴욕적인 역사들을 딛고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부산의 자존심에도 또 한 번 깊은 상처가 남았다.
박진섭 감독이 이끄는 부산은 26일 오후 3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최종 라운드에서 충북청주와 1-1로 비겼다. 이날 무승부로 부산은 승점 70(20승 10무 6패)을 기록, 같은 시각 서울이랜드를 꺾은 김천 상무(승점 71)에 우승 트로피와 다이렉트 승격권 모두 내줬다.
이로써 부산은 K리그1 11위 팀(미정)과의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이겨야만 다음 시즌 K리그1 무대를 누빌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2020년 강등 이후 찾아온 승격과 창단 첫 K리그2 우승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만큼, 이날 선수단과 팬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좌절감은 그 어떤 경기보다도 컸다.

1983년 출범 원년부터 프로축구 무대를 누볐던 부산은 대우 로얄즈와 부산 아이콘스 시절들을 거치면서 K리그를 대표하는 명문으로 자리잡았다. K리그 정상엔 네 차례(1984·1987·1991·1997)나 올라 이 부문 공동 5위에 올라 있고, 리그컵 우승 3회, FA컵 우승 1회 등도 차지한 K리그 대표 명문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모기업이 바뀌고 투자가 줄어들면서 전력도 크게 약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2013년 K리그에 승강제가 도입된 지 세 번째 시즌 K리그 클래식(현 K리그1) 11위로 추락한 뒤, 수원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져 강등 수모를 겪었다.
당시 부산의 강등은 K리그 역사에도 굴욕적인 기록들로 남았다. 기업구단으로는 최초이자 K리그 우승 경력이 있는 구단으로도 최초의 강등이었기 때문이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구단주인 구단의 강등이라는 점도 구단 입장에선 뼈아픈 기록이었다.
굴욕적인 강등을 겪고도 부산은 곧바로 재승격하지 못했다. 강등 첫해인 2016년엔 K리그 챌린지 준 PO에서, 2017년과 2018년엔 2년 연속 승강 PO에서 각각 좌절을 겪었다. 2019년에야 부산은 K리그2 준우승 이후 승강 PO에서 경남FC를 제치고 5년 만에 재승격에 성공했다.


그러나 재승격의 기쁨은 불과 한 시즌 만에 절망으로 다시 바뀌었다. 부산은 2020시즌 K리그1 최종전에서 성남FC에 역전패를 당해 리그 최하위로 추락, 재승격 시즌 재강등됐다. 당시 부산은 27경기에서 단 5승(10무 12패)에 그쳤고, 득점률도 0점대(0.93골)에 그치는 졸전을 반복했다. 부산의 승격을 이끌었던 조덕제 감독의 시즌 막판 사퇴 등 악재들이 겹쳤다. 기업구단이 두 번이나 강등되는 최초의 불명예 기록마저 부산의 몫이 됐다.
첫 강등 직후 곧바로 K리그2 상위권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두 번째 강등 여파는 부산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강등 첫 시즌엔 5위로 K리그2 PO 진출마저 실패했다. 모기업의 악재가 더해지면서 투자마저 끊긴 지난 시즌엔 11개 구단 중 10위까지 추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야말로 명가의 추락이었다.
벼랑 끝까지 몰린 부산은 박진섭 감독 체제로 반등을 준비했다. 지난 시즌 도중 부임한 박 감독은 앞서 광주FC의 승격을 이끌었던 경험을 토대로 새 시즌을 준비했다. 단단한 수비력을 앞세운 0점대 실점률, 다양한 득점 루트 등은 부산의 고공비행으로 이어지는 듯 보였다. 부산은 여름 들어 본격적인 선두 경쟁을 펼치기 시작했다. 8월 중순 이후엔 6연승 포함 8승 1무의 압도적인 기세를 이어갔다. 9월 3일 선두 자리에 오른 뒤엔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김천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 최종전을 앞두고 1점 차 역대급 우승 경쟁이 펼쳐졌다. 이기면 우승이었던 충북청주와의 최종전. K리그2 우승과 다이렉트 승격을 향한 부산의 공세가 이어졌다. 후반 23분 페신의 선제골이 나오며 우승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그러나 마지막을 버티지 못했다. 조르지의 오버헤드킥이 부산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며 극장골 실점으로 이어졌다. 결국 경기는 1-1 무승부. 부산이 모든 걸 놓치는 순간이었다.
김명석 기자 clear@edail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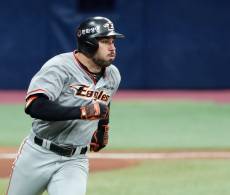

















![[포토] 에이티즈 윤호, 줌 유발하는 잘생긴 미모](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24.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윤호, 남신의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25.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윤호, 젠틀맨의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26.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성화, 똘망똘망 눈망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21.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성화, 멋쟁이의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22.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성화, 매력적인 보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23.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홍중, 캡틴의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16.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홍중, 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19.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홍중, 손만 올려도 화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17.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홍중, 이렇게 멋져도 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20.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홍중, 내가 바로 캡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18.400x280.0.jpg)
![[포토] 옷매무새 고치는 에이티즈 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14.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