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돌아온 레이나 해결사 변신' GS칼텍스, 흥국생명 꺾고 톱3 진입 다가서
- '기부천사'로 돌아온 탁구 아이콘 신유빈, 2년 연속 1억원 기부
- '유리몸' 앤서니 데이비스, 또 내전근 부상...결장률 무려 50%
- 프로농구 소노, 알바노 봉쇄 실패...홈에서 6연패
- 한지민, 이서진이 찍은 ‘굴욕샷’ 공개 “진짜 짜증나” (비서진)
- 이지현, 자식농사 대박났다…ADHD 진단 아들, 금쪽이에서 수학영재로
- 지상렬 ,‘16살 연하’ 신보람과 애정전선 이상無 “내 첫사랑” (살림남)
- 고아라, 자연미인의 위엄 [IS하이컷]
- 변우석, 센스 넘치는 산타…스태프들에 각인 운동화 선물
- '3점숏 9개→커리어 하이+구단 최다 경신' 이민지, KB 역전승 견인
연예일반
[왓IS] ‘우영우’ 냉정했던 강기영의 변화, 유독 공감되는 이유
등록2022.07.14 11:08

ENA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대형 로펌 한바다의 정명석(강기영 분) 변호사는 자신의 로펌에 새로 들어온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와 첫 만남을 가진 뒤 로펌 대표 한선영(백지원 분)에게 이 같이 말했다.
그랬던 정명석은 변화한다. 사건을 맡겨 보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면 내보내겠다던 정명석은 첫 사건에서 우영우에게 가능성을 본다. 소통하는 방법이 다른 것일 뿐 우영우가 의뢰인을 만나지 못 하거나 재판에 나갈 수 없는 변호사가 아니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간 자폐 스펙트럼은 여러 작품에서 사용돼 왔다. “백만불짜리 다리”라는 유행어를 남긴 영화 ‘말아톤’부터 인기에 힘입어 미국에서 리메이크까지 된 드라마 ‘굿닥터’까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들의 비범한 재능을 다룬 작품은 지금까지도 왕왕 있었다. 장애로 그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하자면 시각 장애인이 비범한 초감각을 가진 무림 고수로 등장하거나 발달 장애인이 강력사건에 휘말리며 키플레이어로 부각되는 작품들도 다수다.

이 작품은 우영우가 김밥에 집착하는 이유, 회전문을 통과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줌으로써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겉보기엔 남달라 보이는 이들이 비장애인들이 다수인 세상에서 한 명의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은 정명석처럼 우영우와 거리감을 좁히고 그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서동일 감독은 “가급적이면 발달 장애인이 겪는 차별이나 무시, 소외 같은 감정들보다 정은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통해서 유쾌하게,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정은혜를 중심에 놓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위풍당당함, 셀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그림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회적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니얼굴’은 장애를 ‘부족함’이나 ‘비범함’으로 포장하지 않고 그저 개인이 가진 하나의 특성으로 담백하게 묘사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세상의 편견을 부드럽게 무너뜨리고 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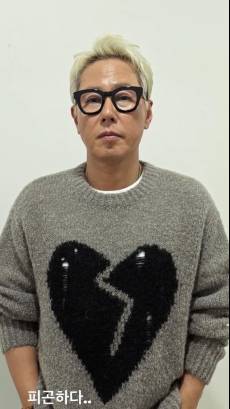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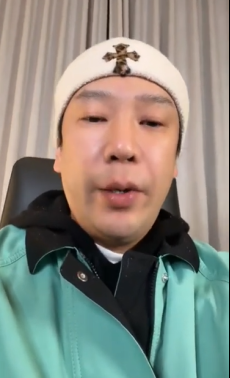















![[포토] 영케이, 귀여운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2.400x280.0.jpg)
![[포토] SBS 가요대전 3MC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3.400x280.0.jpg)
![[포토] 엔시티 드림, 백마 탄 왕자님들 여기 다 모였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9.400x280.0.jpg)
![[포토] 엔시티 드림 마크, 귀엽게 팔 흔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1.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장원영, 눈맞춤에 심쿵](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7.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장원영, 럭키비키 워킹](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6.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산타걸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8.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안유진, 아름다운 드레스 자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5.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멋진 무대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4.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 왕자님 비주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0.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시크한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3.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산, 멋진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1.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