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부고] 권정화 SM엔터테인먼트 유닛장 부친상
- 허지웅, 尹 내란 무기징역 선고에 “고령이면 죽을 죄 아니란 건가” [왓IS]
- 황희찬 소속사 '갑질 논란'에 다시 한 번 반박! "의전 업체 고소장 접수 완료"
- '캐나다 상대 필승' 노리는 한국 여자 컬링 '팀 5G' 4강행 열쇠는 '빙질 적응' [2026 밀라노]
- 기쿠치, 불펜 투구서 다양한 변화구 테스트…"문제 없다"→WBC 한국전 등판 청신호
- '어머니의 나라, 정말 뛰고 싶었는데' 에드먼도 오브라이언도, 부상으로 눈물 훔친 한국계 메이저리거
- IEA 의장 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해법 제시
- [영상] 에스파, ‘화이트 여신’ 강림… 비주얼이 아주 그냥 난리자베스
- ‘솔로지옥5’ 최미나수, 소속사 밝혔다…연예 활동 신호탄 [왓IS]
- 프로축구 FC서울, 야잔과 재계약
축구
[단독]축구협회 1급 심판의 양심선언 "축구협회, 오심 인정하라!"
등록2020.07.17 06:00

2020시즌 K리그가 '오심 논란'으로 멍들고 있다.
1라운드부터 시작됐다. 강원 FC와 FC 서울전에서 나온 고요한(서울)의 오프사이드 판정을 시작으로 2라운드 상주 상무-강원전 골키퍼 이범수(강원) 핸드볼 파울, 10라운드 상주-전북 현대전 송범근(전북) 백태클 그리고 11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수원 삼성전 김민우(수원) 골 취소 등 심판 판정 이슈가 K리그를 지배했다.
오심 논란이 계속 터지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행태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강원-서울전 고요한 오프사이드 장면을 이례적인 '판독불가'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3개의 장면은 모두 정심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다 할 의문제기와 논란이 없었던 10라운드 수원-서울전 오심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논란이 뜨겁고 모두가 아니라는 판정에는 그들만의 판정 잣대를 들이대며 정심이었다고 항변했다.

지난 13일 심판위원회는 K리그 심판 운영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축구협회로 이관된 뒤 첫 번째 공식브리핑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민우 골 취소가 정당한 판정이었다고 당당히 설명하다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이 브리핑은 축구협회와 심판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역효과만 낳았다.
상황이 이렇게 변질되자 심판 '양심'을 걸고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나선 이들을 일간스포츠가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축구협회와 심판위원회의 지휘 아래 그들의 눈치를 봐야하고, 경기 배정과 생계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는 많은 심판들과 달리 용기를 낸 심판은 두 명이다. 그들 모두 축구협회 1급 심판이다.
A씨는
"사실 1라운드부터 오심이 많았다. 그런데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더니 수원-서울전 오심 하나를 인정했다. 진짜 오심으로 인정해야 할 오심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정심(正審)이라 이야기 한다. 브리핑을 하는 것도 봤다. 누구 하나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내가 나서게 됐다.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김민우 골도 오심, 송범근 태클도 퇴장을 줬어야 한다고 봤다. 이범수 핸드볼 역시 퇴장감이라 강조했다.
A씨는
"나만의 의견이 아니라 주변 심판들과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다. 송범근과 이범수는 대부분이 퇴장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송범근 같은 경우 심판위원회는 문선민이 밟았다고 했다. 이제 태클을 할 때 상대 발 밑으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범수 장면에 대해 궤적을 봤다는 말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김민우도 골이 인정됐어야 했다. 심판위원회 스스로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가 된 장면을 제외하고 그냥 지나친 또 다른 오심도 수차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승패를 좌우하는 오심인데도 심판위원회는 눈을 감았다는 것이다.
A씨는
"판정이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그때 그때 모면하려다보니 추후 이 규칙을 다시 적용하는 입장에서 심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나중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깔끔하게 파울이 맞다, 퇴장이 맞다, 심판이 잘못봤다, 이러면 끝이다. 심판이 실수를 했을 때 벌, 또는 징계를 받으면 된다. 인정할 것 인정하면 된다. 그런데 심판위원회는 그러지 않고 있다. 잘못된 부분이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쉬쉬하고, 눈치를 본다. 정말 오심으로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한다면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진다"고 개탄했다.
또 다른 축구협회 1급 심판 B씨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 역시 김민우, 송범근 등 장면이 오심이었다고 판정했다. 또 그 역시 논란이 된 장면을 제외한 오심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주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 심판위원회가 결론을 정해놓고 갖다 붙인 것 밖에 없다. 자신들이 유리하게 판정을 해석한다. 일반인, 축구 규칙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다. 규칙서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 오심도 사소한 실수도 많다. 심판을 챙기고 심판을 살리려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같은 장면인데 다른 판정을 내리면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를 덮으려면 또 하나를 덮어야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니까 힘든 것이다. 정말 심판 살리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건 축구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씨는 '리스펙트(RESPECT)'라는 단어를 꺼냈다. 축구협회가 시행하는 리스펙트 캠페인이다.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심판복에도 리스펙트가 새겨져 있다.
B씨는
"심판위원회가 조금 더 공정해졌으면 좋겠다. 심판도 리스펙트를 달고 뛴다. 팬, 선수, 구단은 심판을 리스펙트하는데 심판은 이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는 것 같다. 심판의 권위도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심판들은 욕먹지 않을 행동을 하면서 권위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용재·김희선 기자 choi.yongjae@joins.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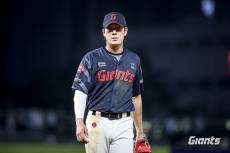














![[포토]이미숙, 등장부터 근사하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305.400x280.0.jpg)
![[포토]이미숙, 반가워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304.400x280.0.jpg)
![[포토]강석우, 꽃할배의 러블리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303.400x280.0.jpg)
![[포토]강석우, 첫 하트포즈입니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302.400x280.0.jpg)
![[포토]한지현, 둘째딸도 사랑해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300.400x280.0.jpg)
![[포토]오예주, 막내의 사랑스러운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9.400x280.0.jpg)
![[포토]오예주, 발랄하고 풋풋하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6.400x280.0.jpg)
![[포토]'찬란한 너의 계절에' 화기애애한 제작발표회 현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5.400x280.0.jpg)
![[포토]강석우, 따뜻함 묻어나는 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4.400x280.0.jpg)
![[포토]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미숙](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3.400x280.0.jpg)
![[포토]채종협, 찬에겐 멜로라기보단 성장드라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1.400x280.0.jpg)
![[포토]이성경-채종협, 여러분의 봄을 책임질게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0.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