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 “AI 기반 혁신과 실행력으로 성장 가속화”
- 새해 상반기 건설업 하루 평균임금 27만9988원
- 이제훈, ‘연기대상’ 품었는데 수갑 찼다…‘모범택시3’ 최대 위기
- ‘영일만 지단’ 김재성 코치 합류…포항, 코칭스태프 구성 완료
- 새해 첫날 일부 복권판매점 로또 발행 일시 중단
- 셀트리온, 미국 뉴저지 생산시설 인수 완료
- 김요한, 새해 겹경사…‘SBS 연기대상’ 우수 연기상→‘합숙 맞선’ MC 발탁
- 원어스, RBW 떠난다…”2월 전속계약 종료, 그룹 활동은 지속” [공식]
- 쿠팡 겨냥한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 준해서 감독"
- SSG닷컴, '쓱세븐클럽' 캐릭터 공개
축구
'친정' 향한 예의·사랑·우정·로열티…그래서 정조국이라 부른다
등록2016.06.17 06:00

"저처럼 축복받은 선수가 또 있을까요."
정조국(32·광주 FC)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다.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친정' FC 서울을 상대로 그리웠던 구장에서 치른 경기가 막 끝난 뒤였다. "어젯밤 잠을 통 자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울컥'의 연속이었어요. 저처럼 축복받은 선수가 또 있을까요." 아직, 그 진한 여운이 가시지 않은듯한 목소리였다.
정조국은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서일까. 그는 친정 팀 라커를 찾아 옛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다. 익숙한 그라운드와 연습실, 그리고 회의실까지 변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일까. 이날 경기 전 만난 정조국의 입가에는 설렘과 기쁨이 교차하는 잔잔한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라운드에서는 눈빛이 달라졌다. 주전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그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며 서울의 골문을 위협했다. 결국 일을 냈다. 팀이 1-2로 뒤지던 후반 24분 조성준이 올린 코너킥이 왼쪽 골 에어리어 인근으로 흘러나오자 정조국이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했다. 2-2 동점을 만드는 귀중한 득점이었다.
어느 선수나 골을 넣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리머니를 펼치게 마련이다. 더군다나 동점을 만드는 슛이었다. 그러나 정조국은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묵묵하게 다음 플레이를 이어갔다.
친정을 향한 배려였다. "세리머니를 하지 않은 것은 친정 서울에 대한 너무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10년 세월이 넘도록 제가 뛰었던 팀입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팬 역시 정조국을 향한 여전한 애정을 보여줬다. 서포터즈 석에서는 "정조국"의 이름이 자주 들려왔고, 골을 넣었을 때도 야유를 보내는 이가 거의 없었다.
정조국은 서울 팬의 뜨거운 마음을 알고 있었다.
"팬들의 콜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다들 너무나 뜨겁게 맞이해주셨어요. 정조국 콜도 해주셨고요. 개인적으로 FC 서울에서 이렇게 사랑받은 선수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영광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래도 헛되이 살지 않고, 잘 살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적장'이 된 최용수(43) 감독은 "정조국은 광주 이적 전까지 FC 서울의 유니폼만을 입었던 충정심이 있는 선수다. 광주라는 좋은 팀에서 좋은 감독을 만나 득점 본능을 보여줬다"며 "프로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 잊힌다. 그러나 정조국은 오늘 박스 인근에서 다양한 각도로 슈팅을 날렸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정조국의 축구 인생은 곧 서울의 역사였다. 그는 2003년 안양 LG 치타스(서울 전신)에 입단한 뒤 통산 275경기에 나서 84골 23도움을 기록했다. K리그를 대표하는 '원 클럽 맨'으로서, 다른 팀 이적을 꿈에도 떠올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시즌 내내 벤치를 지키는 날이 늘어나면서 '더 나은 아빠가 되기 위해' 광주를 선택했다.
광주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 15일 경기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이유다. "다른 유니폼을 입고 서울과 경기를 하고, 제가 골을 넣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제 집 같은 곳이에요. 매번, 서울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든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뜨거운 우정도 여전했다. 정조국은 이날 경기가 끝난 뒤 박주영(31·FC 서울)과 유니폼을 교환하고, 뜨겁게 포옹했다. 팬들은 적으로 만나도 훈훈한 우정에 박수를 보냈다.
정조국은 "(박)주영이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자 함께 축구인생을 걸어갈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둘이 맞대결을 벌이다니…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울컥'의 연속이네요"라며 웃었다. 슬픔, 사랑, 아픔, 기쁨, 감사가 가득 담긴 그런 미소였다.
서지영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글로벌 No.1 CDMO 향해 도약"[신년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0200234B.jpg)
![[2026 유망바이오 톱10]엘앤씨바이오, '품절템' 리투오 앞세워 사상 최대 실적 예고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0200217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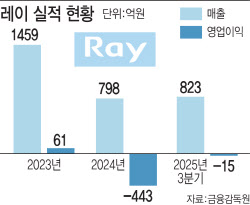









![[포토] 정소민, 파격적인 드레스 뒤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8.400x280.0.jpg)
![[포토] 정소민, 우아한 걸음걸이로 퇴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6.400x280.0.jpg)
![[포토] 정소민, 아름다움에 홀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7.400x280.0.jpg)
![[포토] 김지훈, 카리스마 눈빛](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4.400x280.0.jpg)
![[포토] 김지훈, 걸음걸이도 완벽한 테리우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3.400x280.0.jpg)
![[포토] 김지훈, 턱시도 핏이 이렇게 잘 어울릴 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5.400x280.0.jpg)
![[포토] 정소민, 아름다운 순백의 여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2.400x280.0.jpg)
![[포토] 정소민, 여신의 걸음걸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0.400x280.0.jpg)
![[포토] 전여빈, 러블리한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57.400x280.0.jpg)
![[포토] 정소민, 우아함 종결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61.400x280.0.jpg)
![[포토] 전여빈, 우아한 블랙 드레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59.400x280.0.jpg)
![[포토] 윤계상, 완벽한 슈트핏](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31/isp20251231000258.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