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2026 밀라노] 유승은, 슬로프스타일 결선 12위…멀티 메달은 좌절
- LG 예비역 1년 차의 다짐 '이정용답게'..."직구 더 빠르게, 더 공격적으로'
- 범접 불가능한 ‘얼음 위의 펠프스’ 크로스컨트리 클레보, 대회 5관왕→통산 10번째 금메달 [2026 밀라노]
- '1등 잡아봤어?' 스웨덴 꺾은 한국-캐나다, 女 컬링 최종전 대격돌…'세계 1위' 넘어야 메달 보인다 [2026 밀라노]
- 264,082,000,000원 받고도 또 '먹튀' 위기…한때 MLB 최고 3루수, 전지훈련 중 짐 싸서 집에서 재활
- [2026 밀라노] ‘개인전 노 금메달’ 남자 쇼트트랙, 히든카드 앞세워 골리앗의 빈틈 노린다
- [TVis] 명예영국인 “남편은 英 배우, 데이팅 앱으로 만나…3년간 열애” (라디오스타)
- ‘위고비 실패’ 케이윌 “마운자로로 하루만에 3kg 감량…중요한 건 의지” (형수는)
- [TVis] 엄지원, 피부 관리법 “바늘로 혀 뚫어…어혈 뺄 때 쾌감” (라디오스타)
- [TVis] 김조한 “‘케데헌’ 사자보이즈 에이전트…조건 너무 깐깐해” (라디오스타)

젊은 관객들 대부분은 알지 못하겠지만 3일 타계한 고(故)김수용 감독이 한국 영화계에 이룬 업적은 심대하다. 무엇보다 어마어마한 창작욕과 창작력으로 후학들에게 귀감이 됐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108편을 만들었다. 비공식적으로 122편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후 좀더 면밀하게 조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58년 ‘공처가’로 데뷔해서 1987년 5공 정권의 ‘허튼 소리’에 대한 검열 파동으로 사실상 은퇴하기까지 약 30년간 그는, 평균 1년에 3편 이상씩 만들었다는 얘기가 된다.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이건 기네스감’이라고 했지만 평소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지는 않고 살았다. 오히려 ‘허튼 소리’ 이후 극도의 침잠 상태로 들어갔으며 1995년의 ‘사랑의 묵시록’과 1999년 ‘침향’을 끝으로 영화 연출은 더 나아가지 못했다. 1929년생인 만큼 나이 70이면 영화감독으로서는 아직 활동이 가능한 나이였지만 혹독한 시대의 어둠이 그의 창작 욕구를 완전히 꺾어 버렸다.
김수용 감독의 대표작들은 두가지 성격으로 구분된다. 그의 작품 경향, 혹은 김수용의 작가적 성향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것에서 기인하는데 한쪽으로는 문예영화를 만들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사회적 시선을 담은 영화를 만들었다. 앞쪽 성격의 대표작은 ‘갯마을’과 ‘산불’ 그리고 ‘안개’다. ‘갯마을’은 오영수 작가의 단편을 토대로 만든 것이며 ‘산불’은 극작가 차범석의 희곡을, 안개는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 제목을 바꿔 만든 것이다. 모두 다 원작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언론은 그에게 ‘문예영화’ 감독이라는 라벨을 붙였다. 문예영화란 말은 다소 고답적인 느낌을 준다. 김수용은 그보다 자신이 철저한 지식인이자 인문주의자임을 나타내려 했다. 60,70년대의 지식인은 책과 문학을 중요시 했고 김수용 역시 영화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학으로부터 그 상상력을 차용해 와야 한다고 믿었다. ‘갯마을’ 등은 그의 그러한 문학 애호의 토대에서 나온 작품들이다.
뒤쪽 성격의 영화들, 그러니까 사회파 영화들도 꽤 만들었는데 ‘저 하늘에도 슬픔이’나 ‘도시로 간 처녀’ 등이 그렇다. 두 작품 모두 도시의 음영, 빈민의 모습들을 담은 작품이다. 사람들은 다음의 이 작품에 사회적 시선이 담겨 있다고 믿지 않겠지만 1977년작 ‘야행’은 모더니즘의 신봉자로서 그 나름대로 독재 정권에 항거한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신성일 윤정희 주연의 ‘야행’은 한 여인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그린 작품으로 섹스신이 제법 나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연히 검열 당국의 탄압을 피해가지 못했으며 1973년에 만들어진 영화는 가위질과 수정, 타협을 거쳐 77년이 되어서야 세상에 나왔다. 모더니즘의 지식인으로서 개인의 자유란 가치를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신봉했던 김수용 감독은 박정희 정권의 닫힌 구조를 욕망의 섹스학으로 대항한 셈이다. 감독이 갖고 있는 표현의 무기는 때론 욕망과 섹스가 된다. 영화감독이 종종 야한 상상을 하는 이유는 그가 그런 취향이어서가 아니라 개인의 그런 감성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를 향해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다. 1977년은 그런 시대였다. 그런 의미에서 ‘야행’은 두고두고 재평가 돼야 할 작품이다.
이만희 감독의 작품을 리메이크한 ‘만추’에서 김혜자와 정동환이 기차길 옆 갈대밭에서 정사를 나누는 그 음욕의 분위기 역시 1981년을 향한 김수용식 격정의 심사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김수용의 ‘만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던 셈인데 이 영화는 이후 김태용 감독이 현빈과 탕웨이를 데리고 세 번째로 리메이크하면서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다. 김태용의 ‘만추’는 금기의 사슬에 묶인 남녀의 아쉬운 러브 스토리로 대체됐다. ‘만추’는 이만희와 함께 김수용의 작품으로 기억돼야 할 영화다.
5일 오전 11시30분에 영화인장으로 열린 영결식에는 많은, 기라성 같은 원로 중견 영화인들이 몰려 들었다. 배우 신영균이 구순의 노구를 이끌고 참석했으며 정지영 이장호 배창호 같은 후배 감독,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같은 후학(그는 김수용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유현목의 제자이다), 장미희 강석우 같은 그가 길러낸 배우들이 함께 했다. 청주대 영화과의 제자들 중에는 조한철이 참석했다.
다행스럽게도 김수용 감독이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영화가 시대의 산물이며 또한 시대를 이어 가며 영속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오랜 제작자 황기성은 조사를 통해 저 하늘에서 신상옥 이만희 김기영 유현목 하길종 감독들을 다시 만나 즐겁게 파티 한번 하시라고 권했다. 그 이름들이 영화계의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다. 김수용의 영화 제목과 달리 ‘저 하늘에도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화 선지자들의 빛나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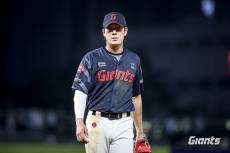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800612T.jpg)









![[포토] 티파니 영, 미소에 홀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5.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이찬원, 한터뮤직어워즈 MC 맡았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7.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우아함 종결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4.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아름다운 드레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2.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사뿐사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6.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공주님 들어가십니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3.400x280.0.jpg)
![[포토] 이찬원, 팬분들 사랑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0.400x280.0.jpg)
![[포토] 이찬원, 멋진 슈트핏](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1.400x280.0.jpg)
![[포토] 이찬원, 여유로운 MC의 입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9.400x280.0.jpg)
![[포토] 윤종신, 18년 만에 내는 정규앨범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7.400x280.0.jpg)
![[포토] 윤종신, 인자한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8.400x280.0.jpg)
![[포토] 이창섭, 감기투혼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5.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