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다저스→양키스→다저스' 얼마나 대단하길래, 또또 웨이버 클레임 '이적'
- “가족급여·법인차량 모두 반납”…김선호, 괜히 1인법인 만들어 이미지만 망쳤다 [왓IS]
- ‘韓 쇼트트랙 최대 적’ 단지누 공언 “우리 목표는 메달 7개” [2026 밀라노]
- 스테이씨 윤, 숏드라마 플랫폼 ‘레진스낵’ 얼굴 됐다
- 김호영, 뮤지컬 당일 긴급 취소 “B형 독감 판정” [전문]
- LGU+,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금 조기 지급
- “수만 명 운집 예상”…서울시, BTS 광화문광장 공연 안전 대응 나섰다
- 삼성전자,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식 '갤S25 울트라'로 생중계
- ‘이병헌♥’ 이민정, 딸 서이 백일 사진 자랑... 앙증맞은 자태
- UFC, 전용 경기장 ‘메타 에이펙스’로 새 단장…2월 8일 첫 대회 개최
연예
[청춘은 맨발이다-100] 문예영화의 전성기
등록2011.09.09 07:01

신성일·윤정희 주연의 영화 '장군의 수염'(1968년). 이어령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이 작품은 지성인의 내면 세계를 그려냈다.
1960년대 중후반 문예영화의 전성기가 찾아왔다. 영화 제작사들은 너도나도 한국 문학의 명작들을 스크린화했다. 나는 67년 김동리 원작의 '까치소리', 황순원 원작의 '일월(日月)', 68년 이어령 원작의 '장군의 수염' 등의 주인공으로 의미있는 작업을 했다.
이어령(전 문화부 장관·현 중앙일보 상임고문)의 중편소설 '장군의 수염'은 66년 월간 세대(世代)에 게재되자마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수염을 기른 장군이 등장하자 국민 모두가 너도나도 수염을 기르는데, 신문사 사진기자 철훈(신성일)만이 수염을 기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결국 지성인 철훈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 박정희 정권을 희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어령은 젊은이 사이에서 지식인의 아이콘이었다. 56년 한국일보에 '우상의 파괴'란 글을 발표한 그는 당시 문학 논쟁을 통해 문단의 '우상'이던 거물 문학평론가 백철 교수를 거꾸러뜨렸다. 62년에는 에세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를 연재하며 한국 문화의 본질과 한국적 정서의 심층을 탐구했고, 66년 소설 '장군의 수염'을 발표해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 영화는 출발점부터 달랐다. 태창흥업 김태수 사장은 시청 부근 중식당에서 이어령을 비롯해 '가고파'의 작곡가 김동진·변종하 화백 등과 함께 기획·자문 회의를 열었다. 기획·자문 회의까지 하면서 제작한 영화는 그 때까지 없었다. 이어령은 한국 영화의 도식적인 틀을 벗어나자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성구 감독도 이어령의 집을 자주 방문하며 여러 차례 의논을 했다.
문화계의 재주꾼들이 이 영화를 위해 손 잡았다. 64년 '무진기행'을 발표한 소설가 김승옥이 이어령의 추천으로 시나리오를 맡았다. 화단의 거물인 변종하 화백이 세트를 꾸몄고, 변 화백의 제자이자 당시 서울대 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내 여동생 강명희·매제가 된 임세택이 그 작업을 도왔다. 강명희·임세택 부부는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며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67년 한국 최초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홍길동'을 제작했으며 만화가 신동우 화백의 형으로도 유명한 신동헌 감독이 영화 중간에 삽입된 애니메이션을 작업했다. 이 장면은 수염을 단 장군이 말을 타고 거들먹거리며 군중을 지나가는 부분이다. 예산상으로도 군중 신을 찍기 부담스럽고, 새로운 형식미로 수염의 상징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소설도 유명했지만 영화로 인해 이 작품은 더욱 화제가 됐다. '장군의 수염'은 문명과 정권을 다의적으로 비판하는 알레고리 수법의 작품이다. 박 정권은 이 영화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워낙 검열이 엄청난 시기여서 자짓하면 상영 중지될 가능성도 있었다. 주변에서 원작자에게 이 작품의 진의를 넌지시 묻는 질문도 많았다.
그 때마다 이어령은 "쿠바 카스트로의 수염 이야기…"라면서 얼버무렸다고 한다. 정부도 젊은이 사이에 인기가 높은 이어령을 건드리는데 부담을 느꼈다. 68년 제7회 대종상에서 제작상과 시나리오상을 수상한 '장군의 수염'은 사회비판적 작품이 아닌, 순수 문예작품으로 분류돼 무탈하게 상영을 마쳤다.
이어령은 "신성일이 지성인의 내적 고독을 잘 소화했다. 신성일은 이 영화를 통해 대학생 사이에서 지적인 배우로 자리매김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령 고문과는 때때로 오가면서 인사한다. 젊은 시절부터 "밥 한 번 먹자"고 부담없이 말하는 그의 담백한 성품이 멋지다.
정리=장상용 기자 [enisei@joongang.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LG엔솔 올해 성과급 75%…실적 개선에 소폭 증가[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400892T.jpg)
![“벌써 한 대 팔려” 이마트 휴머노이드 매장…로봇 세상 현실로[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400736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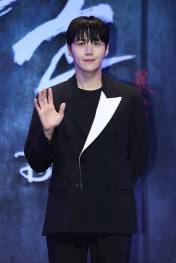







![[포토] 나빌레라, 화려한 엔딩](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32.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우아하게 날아오르는 나비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31.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릴라, 치명적인 엔딩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30.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릴라, 치명적인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9.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애니, 우아한 나비 무브먼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8.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사야, 귀여운 똑단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7.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멋진 나비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6.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뛰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5.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신나는 '노리미트' 무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4.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우아한 나비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3.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군무 착착](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22.400x280.0.jpg)
![[포토] 나빌레라, 쿵짝쿵짝](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3/isp20260203000218.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