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안티 팬 상대 7억 손배소 패소…소송 4년 8개월 만
- 네이버웹툰, 인기 남주 모은 '어화둥둥 꽃선비단' 론칭
- 박명수, KBS 저격? “쌀 아직 못 받았다… 체크 요망” (라디오쇼)
- [왓IS] 故서희원 친동생 서희제, 형부 구준엽에 감사…”마지막 3년 곁에서 지켜줘”
- '음주운전→헝가리 귀화' 김민석, 한국 대표팀 훈련에서 포착 왜? [2026 밀라노]
- 프로축구연맹, ‘2025 사회공헌활동 백서’ 발간
- [포토] 한승우, 남자라면 엄지척
- [포토] 한승우, 멋스러운 입장
- [포토] 에버글로우 온다, 패션을 위한다면 춥지 않아요~
- [포토] 에버글로우, 요정들의 하트 공격
생활/문화
‘너도나도 저주받은 세대’ 대입 제도의 변화
등록2008.01.24 11:10
마루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 세균부대 중 하나였던 731부대에서 희생된 인체실험 대상자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의 대학입시제도는 해방 이래 6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가 넘는 변천을 겪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기에 해당되는 고등학생들은 교육제도의 실험대 위에 올라선 마루타 신세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획기적인 대입 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가 자신들이 ‘저주받고 폭탄 맞은’ 세대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혼란스러웠던 대입 제도 변천사를 돌아봤다.
△1962년생(81학번)
1980년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대학 본고사가 사라졌다. 신군부는 “국·영·수 등에 집중된 고학력 경쟁고사라 할 수 있는 본고사로 인해 고액 과외가 성행하고 빈부간 위화감이 커진다”는 이유를 들어 대입 제도를 예비고사로 바꾸었다.
81년 대입을 준비하던 고3 수험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본고사로 인한 치열한 경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고3 수험생이었던 박성훈(46)씨는 “과외를 안해도 되고 어려운 본고사도 사라져 환호성을 질렀다. 그런데 대학을 지원하면서 천국은 지옥으로 변했다”고 회상했다.
수십 개의 대학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복수지원제도로 인해 경쟁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당시 서울대 특정과의 경우에 경쟁률은 높았지만 실제론 미달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쟁률이 수십 대 1이 되니까 수험생들이 지레 겁을 먹고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다”고 전했다.
△1969년생(88학번)
88학년도에는 학력고사 제도에 대학을 선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시험 성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대학을 지원해서 시험 결과로 당락이 결정됐다. “일단 대학을 지원해 놓고 시험을 봤는데 커트라인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다.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었는데 못가게 돼 아쉬움을 넘어 화가 났다.”
신형섭(39)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때는 언론에서 각 대학별·과별로 경쟁률을 소개하는 것이 주요 뉴스 중 하나였다. 마감 시간 직전까지 경쟁률이 약한 대학에 원서를 넣기 위해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족·친척 등이 동원돼 경쟁률을 알려주느라 공중전화엔 긴 줄이 늘어섰다.
△1975년생(94학번)
94학년도부터 학력고사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도입됐다. 첫해엔 수능을 두 번 보는 방식이었다. 그 중 좋은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번의 시험이 난이도가 서로 달라 기회의 제공보다는 제대로 된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당시 수능을 치렀던 이수현(33)씨는 “첫 번째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런데 답을 밀려 쓰는 바람에 시험을 망쳤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 집중했는데 너무 어려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며 “새 입시 제도의 희생양이었다”고 분노를 표현했다. 게다가 4지선다에서 5지선다로, 암기 위주에서 응용·이해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로 유형이 바뀌면서 큰 혼돈을 겪었다.
△1989년생(08학번)
2008학년도엔 수능등급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된 제도의 변화는 수험생들에게 큰 고난을 안겼다. 내신과 수능, 논술이라는 3중고를 겪게 된 것이다. ‘저주받은 89년생’이라는 김정민(19)씨는 “내 옆의 친구를 적이라 생각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라 입시 정보도 없어 모두가 우왕좌왕했다. 실험용 쥐라는 생각만 들었다”고 고백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수능등급제는 겨우 한 해만에 사실상 폐지될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다시 변화를 맞게 될 대입 제도 앞에서는 누군가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방현 기자 [ataraxia@ilgan.co.kr]
그리고 그 변화의 시기에 해당되는 고등학생들은 교육제도의 실험대 위에 올라선 마루타 신세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획기적인 대입 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가 자신들이 ‘저주받고 폭탄 맞은’ 세대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혼란스러웠던 대입 제도 변천사를 돌아봤다.
△1962년생(81학번)
1980년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대학 본고사가 사라졌다. 신군부는 “국·영·수 등에 집중된 고학력 경쟁고사라 할 수 있는 본고사로 인해 고액 과외가 성행하고 빈부간 위화감이 커진다”는 이유를 들어 대입 제도를 예비고사로 바꾸었다.
81년 대입을 준비하던 고3 수험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본고사로 인한 치열한 경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고3 수험생이었던 박성훈(46)씨는 “과외를 안해도 되고 어려운 본고사도 사라져 환호성을 질렀다. 그런데 대학을 지원하면서 천국은 지옥으로 변했다”고 회상했다.
수십 개의 대학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복수지원제도로 인해 경쟁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당시 서울대 특정과의 경우에 경쟁률은 높았지만 실제론 미달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쟁률이 수십 대 1이 되니까 수험생들이 지레 겁을 먹고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다”고 전했다.
△1969년생(88학번)
88학년도에는 학력고사 제도에 대학을 선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시험 성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대학을 지원해서 시험 결과로 당락이 결정됐다. “일단 대학을 지원해 놓고 시험을 봤는데 커트라인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다.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었는데 못가게 돼 아쉬움을 넘어 화가 났다.”
신형섭(39)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때는 언론에서 각 대학별·과별로 경쟁률을 소개하는 것이 주요 뉴스 중 하나였다. 마감 시간 직전까지 경쟁률이 약한 대학에 원서를 넣기 위해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족·친척 등이 동원돼 경쟁률을 알려주느라 공중전화엔 긴 줄이 늘어섰다.
△1975년생(94학번)
94학년도부터 학력고사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도입됐다. 첫해엔 수능을 두 번 보는 방식이었다. 그 중 좋은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번의 시험이 난이도가 서로 달라 기회의 제공보다는 제대로 된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당시 수능을 치렀던 이수현(33)씨는 “첫 번째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런데 답을 밀려 쓰는 바람에 시험을 망쳤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 집중했는데 너무 어려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며 “새 입시 제도의 희생양이었다”고 분노를 표현했다. 게다가 4지선다에서 5지선다로, 암기 위주에서 응용·이해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로 유형이 바뀌면서 큰 혼돈을 겪었다.
△1989년생(08학번)
2008학년도엔 수능등급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된 제도의 변화는 수험생들에게 큰 고난을 안겼다. 내신과 수능, 논술이라는 3중고를 겪게 된 것이다. ‘저주받은 89년생’이라는 김정민(19)씨는 “내 옆의 친구를 적이라 생각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라 입시 정보도 없어 모두가 우왕좌왕했다. 실험용 쥐라는 생각만 들었다”고 고백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수능등급제는 겨우 한 해만에 사실상 폐지될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다시 변화를 맞게 될 대입 제도 앞에서는 누군가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방현 기자 [ataraxia@ilgan.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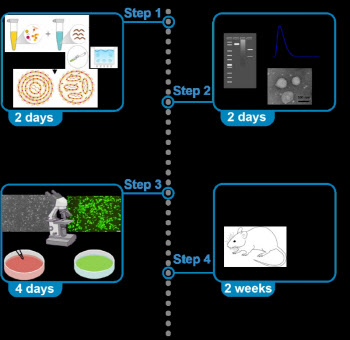


![LG엔솔 올해 성과급 75%…실적 개선에 소폭 증가[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400892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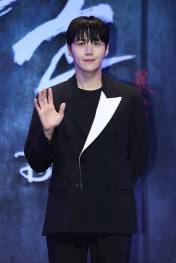







![[포토] 한승우, 멋스러운 입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26.400x280.0.jpg)
![[포토] 한승우, 남자라면 엄지척](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25.400x280.0.jpg)
![[포토] 에버글로우 온다, 패션을 위한다면 춥지 않아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21.400x280.0.jpg)
![[포토] 에버글로우, 요정들의 하트 공격](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20.400x280.0.jpg)
![[포토] 에버글로우, '페노메논시퍼' 컬렉션 쇼 왔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19.400x280.0.jpg)
![[포토] 아이덴티티 도훈-누리-환희, 잘 부탁드립니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17.400x280.0.jpg)
![[포토] 아이덴티티 도훈-누리-환희, 서울패션위크 왔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15.400x280.0.jpg)
![[포토] 드림캐쳐 수아, 사랑스러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14.400x280.0.jpg)
![[포토] 드림캐쳐 수아, 치명적인 올블랙 시크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18.400x280.0.jpg)
![[포토] 드림캐쳐 수아, 아름다운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11.400x280.0.jpg)
![[포토] 손동표, 귀여운 패션으로 '서울패션위크' 왔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10.400x280.0.jpg)
![[포토] 손동표, 헤헤 볼하트 받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4/isp20260204000213.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