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케이더블유인터내셔널, 아마존 글로벌셀링 SEND 서비스 해상 운송까지 확대
- KB손해보험, 대한항공 꺾고 3연승 질주…비예나 26점
- 1R 지명 계약금 27억 유망주에서 '실패한' NPB 1할 타자로…'김혜성 동료' 미국 복귀, CIN행
- ‘시즌 복귀 목표’ BOS 에이스, 크리스마스이브에도 맹훈련 “코트로 돌아왔다”
- 네이즈, 1월 일본 지상파 드라마 첫 방송 앞두고 뜨거운 행보…데뷔 전부터 글로벌 활약
- 故 김영대 평론가, 사망 비보…윤종신→정용화 애도
- 15년째 ‘산타’된 롯데삼동복지재단, 울산지역 아동 2000명에게 1억2000만원 상당 플레저 박스 전달
- '3점포 16개' 한국가스공사, KT 잡고 4연패 탈출...소노는 현대모비스에 승리
- 개인정보 유출 파문 쿠팡. “유출자 특정 완료, 외부 전송 없다는 진술 받았다”
- ‘이강인 활약상 포함’ 2025년 돌아본 PSG “굴하지 않는 정신력 보여줬다”
경제
두번째 넘는 국경 또다시 버스로
등록2006.09.21 08:46

물탄-밤(이란).
한국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모양이다. 다운이 삼부토건에 하루를 머물면서 한국식을 몇끼 먹곤 얼굴색이 달라졌다. 물론 하루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진 못했지만 파키스탄을 넘으려면 아직 넘어야 할 고개가 많아 이곳에서 이틀을 쉰 것이 오히려 다행이기도 하다.
물탄에 도착해 여행자들에게 악명높은 도시인 퀘타의 현지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서에 들렀다. 가는 길을 설명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등의 정보를 얻으러 갔지만 경찰은 이 구간만큼은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한다. 페샤와르에 머무르는 동안 일어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도 그렇고. 얼마 전 카라치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로 정세가 불안하단 이유다.
혹여 우리가 경찰에 알리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해도 분명 도로에서 경찰이 보게 되면 차에 실어 이동시킬 것이란 거다. 퀘타는 반군과 정부군과의 충돌이 많은 지역이란 것은 알았지만 그 길목 역시 이리도 위험천만한 곳이라니 은근히 겁이 나면서도 왠지 금기시 된 곳을 가고 싶은 호기심도 생긴다.
그렇지만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우린 중국에서 이곳을 넘어왔을 때처럼 파키스탄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물탄에선 기차역으로 경찰차에 실려가 열 몇시간 동안이나 침대칸도 아닌 딱딱한 의자에 앉아 퀘타로 이동하고 다시 에어컨도 없고 게다가 창문도 열리지 않는 버스에 실려 국경으로 이동했다.

이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한 것보다야 덜 힘들겠지만 열악한 이동수단으로 국경까지 가는 것도 웬만한 체력 아니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된 경험이었다.
파키스탄의 국경도시인 타프탄은 몇몇 환전소를 빼곤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그저 국경일 뿐이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파키스탄 구역을 지나 이란에 들어서니 시원스레 뻥 뚫린 아스팔트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야~여기선 정말 라이딩 할 맛 좀 나겠다’하고 자전거를 손보는데 수속을 도와주던 이란 아저씨가 와서 하는 말이 ‘여기서 자전거 차고 가려고? 총 맞아 죽고 싶어? 좀 있으면 경찰이 올테니까 기다렸다가 같이 가’하는 게 아닌가.
두 번째 넘는 국경도 결국 이렇게 지나는 건가. 잠시 후 경찰이 아닌 군인이 총까지 들고 나타나선 우리 일행이 탄 차를 호위한다. 국경에 근접한 도시인 자헤단에 도착했을 때 다른 경찰이 우리를 인수하곤 떠날 생각을 안한다. 한참을 길거리에서 기다리다보니 다른 경찰이 와서는 자헤단에 머물지 말고 버스편으로 밤으로 이동하란다.
거기서부턴 안전하다는데 말하는 도중 다운을 보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한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다운이 목에 걸고 있는 총알 목걸이가 문제였다.
소리를 지르며 당장 빼라며 자칫 한 대 칠 것 같은 험한 분위기다. ‘알았어…뺄게. 이거 그냥 모양이야. 화내지마…’하며 풀기도 힘든 목걸이줄을 결국 칼로 잘라내서야 경찰이 화를 멈췄다. 이란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게 뭐람.
‘아무래도 안되겠다. 여기선 우리가 뭘 할 수 없겠어. 말 듣고 밤으로 이동하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강압적인 경찰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밤(이란)=남영호 유라시아탐험대(www.eurasia2006.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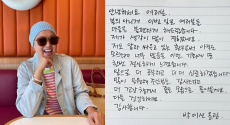




![[르포]쇠락의 기억 위에 켜진 '오렌지 빛'…한화가 살린 필리조선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2500342T.jpg)










![[포토] 영케이, 귀여운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2.400x280.0.jpg)
![[포토] SBS 가요대전 3MC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3.400x280.0.jpg)
![[포토] 엔시티 드림, 백마 탄 왕자님들 여기 다 모였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9.400x280.0.jpg)
![[포토] 엔시티 드림 마크, 귀엽게 팔 흔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11.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장원영, 눈맞춤에 심쿵](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7.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장원영, 럭키비키 워킹](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6.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산타걸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8.400x280.0.jpg)
![[포토] 아이브 안유진, 아름다운 드레스 자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5.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멋진 무대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4.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 왕자님 비주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0.400x280.0.jpg)
![[포토] 스트레이 키즈 현진, 시크한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3.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산, 멋진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2/25/isp20251225000201.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