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권상우 ‘하트맨’, 3위 출발…‘아바타: 불과 재’ 잡는다 [IS차트]
- 볼빨간사춘기 안지영, 켄버스와 전속계약…”설렘과 긴장감 공존”
- 구성환, 2종 소형 면허 3번째 도전…마음만은 ‘비트’ 주인공 (나혼산)
- ‘아기공룡 둘리’ 고길동 목소리… 성우 故 이재명, 오늘(15일) 1주기
- 이종원·신예은·보넥도 명재현, ‘2026 디 어워즈’ MC 확정
- ‘리그 6경기 284분’ 홍현석, 낭트 떠나 친정 헨트로 임대
- 강성형 감독의 강력한 항의 이유 있었네, KOVO 비디오 판독 '오독' 인정·사과
- (주)에임즈미디어, 한국형 AI 영상 콘텐츠로 세계의 이목 집중
- 박보검→이선빈, 김한민 ‘칼: 고두막한의 검’ 캐스팅 라인업 확정
- '철벽 수비+결승골' 김민재 '맨 오브 더 매치' 선정에 요나단 타도 '박수+100점 만점' 응원
무비위크
<한반도>가 생각하는 애국
등록2006.06.29 09:00
1993년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 투입된 미군 레인저 부대의 실화를 그린 영화 <블랙 호크 다운> 의 끝부분에는 포위됐던 레인저 부대원들이 반군들의 총격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탱크와 장갑차에 타지 않고 달려서 후퇴하는 장면이 나온다.
왜 그랬을까. 영화상으로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지만 마크 보우든이 쓴 논픽션 원작을 읽어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장갑차 안에는 전사자의 시체들이 타고 있어 산 사람을 위한 자리가 부족했던 것이다. 보우든은 이 조치를 '죽은 사람들을 위해 또 다른 전사자를 만들 지 모르는 명령을 내린 것은 숭고하긴 하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당시 지휘관들을 비판했지만 '전우의 시체를 적의 손에 넘길 수 없다'는 이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한국의 16강 탈락으로 4년전 같지는 않지만 월드컵 응원을 매개로 한 애국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가운데 강우석 감독의 영화 <한반도> 가 치열한 애국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선을 보였다. 이 영화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질곡의 역사를 바로 잡자'는 구호다. 우리에게 분단과 민족상잔의 상처를 준 일본을 응징해야 하며, 친일 청산과 역사정립에 반대하는 것은 구한말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행위라는 것이 이 영화의 논지다.
외부의 적을 설정해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용한 전술이지만 이런 논리 전개 때문에 <한반도> 를 둘러싼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일본과의 공조를 추진하는 세력을 매국노의 대명사인 을사오적과 동일시할 정도로 이 영화의 표현은 극단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과연 애국심의 고취는 이런식의 피아 구분에 의해서만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적에 대한 증오보다는 일단 '우리 나라'가 '우리 국민'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신념이 애국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29일은 2002년 서해교전으로 6명의 해군 장병이 사망한지 꼭 4년째인 날이었다. 당시 국민들은 4강 신화에 매료돼 있었고, 한국 대통령도 순국한 장병들의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결승전과 폐막식을 참관하고 있었다. 희생자 가족들은 이후에도 서해교전에 대한 정당한 평가 요구는 통일 논의의 걸림돌처럼 여겨졌다는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물론 '반일=통일=애국'과 '친일=반통일=매국'의 흑백 구도를 좇고 있는 <한반도> 에는 이런 이야기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서해교전 4주기에 돌아보는 <한반도> 논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과연 영화 <한반도> 가 추구하는 '우리 나라'는 나라를 위해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해야 할 보답을 다 하고 있는가. "진실을 외면한 생존은 의미가 없다"는 극중 최민재 박사의 부르짖음은 상대가 일본일 때에만 적용되는 것일까.
왜 그랬을까. 영화상으로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지만 마크 보우든이 쓴 논픽션 원작을 읽어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장갑차 안에는 전사자의 시체들이 타고 있어 산 사람을 위한 자리가 부족했던 것이다. 보우든은 이 조치를 '죽은 사람들을 위해 또 다른 전사자를 만들 지 모르는 명령을 내린 것은 숭고하긴 하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당시 지휘관들을 비판했지만 '전우의 시체를 적의 손에 넘길 수 없다'는 이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한국의 16강 탈락으로 4년전 같지는 않지만 월드컵 응원을 매개로 한 애국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가운데 강우석 감독의 영화 <한반도> 가 치열한 애국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선을 보였다. 이 영화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질곡의 역사를 바로 잡자'는 구호다. 우리에게 분단과 민족상잔의 상처를 준 일본을 응징해야 하며, 친일 청산과 역사정립에 반대하는 것은 구한말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행위라는 것이 이 영화의 논지다.
외부의 적을 설정해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용한 전술이지만 이런 논리 전개 때문에 <한반도> 를 둘러싼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일본과의 공조를 추진하는 세력을 매국노의 대명사인 을사오적과 동일시할 정도로 이 영화의 표현은 극단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과연 애국심의 고취는 이런식의 피아 구분에 의해서만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적에 대한 증오보다는 일단 '우리 나라'가 '우리 국민'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신념이 애국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29일은 2002년 서해교전으로 6명의 해군 장병이 사망한지 꼭 4년째인 날이었다. 당시 국민들은 4강 신화에 매료돼 있었고, 한국 대통령도 순국한 장병들의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결승전과 폐막식을 참관하고 있었다. 희생자 가족들은 이후에도 서해교전에 대한 정당한 평가 요구는 통일 논의의 걸림돌처럼 여겨졌다는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물론 '반일=통일=애국'과 '친일=반통일=매국'의 흑백 구도를 좇고 있는 <한반도> 에는 이런 이야기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서해교전 4주기에 돌아보는 <한반도> 논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과연 영화 <한반도> 가 추구하는 '우리 나라'는 나라를 위해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해야 할 보답을 다 하고 있는가. "진실을 외면한 생존은 의미가 없다"는 극중 최민재 박사의 부르짖음은 상대가 일본일 때에만 적용되는 것일까.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브랜드미디어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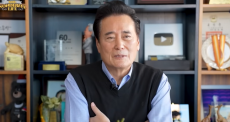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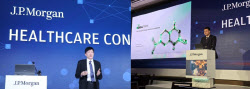
![에이즈 비밀 밝힌 연구에 韓기술 쓰였다...큐리옥스, 네이처 논문 등재[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500254T.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64.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귀여운 크로스하트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63.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화끈함 자신있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62.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기대해도 좋아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61.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패널 군단들의 케미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9.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포토타임에서도 느껴지는 케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8.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재미있는 케미를 보여드릴 패널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60.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덱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4.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한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6.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덱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5.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이다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7.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규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3.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