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라인게임즈 '엠버 앤 블레이드', 에픽게임즈 스토어 선정 2026년 기대작
- 아이브, 오늘(9일) 신곡 ‘뱅뱅’ 선공개…주체적 태도 전한다
- 블핑 제니 “자꾸 보고 싶어” 공개 고백…상대는 연상녀 [IS하이컷]
- 데브시스터즈, 지난해 연간 매출 두 자릿수↑…'쿠키런' IP 강화
- 삼화식품, 설 맞아 장류 및 국수 전하며 이웃사랑 실천
- JTBC ‘톡파원’→‘혼자는 못 해’ 등 휴방…동계올림픽 중계 여파
- '유리몸' 데이비스의 워싱턴 데뷔전은 2026~27시즌에야 가능? 이적 후 시즌 아웃설 솔솔
- ‘학폭의혹 해명’ 황영웅, 강진군 축제 서나 [왓IS]
- 크래프톤, 연간 매출 신기록…'배틀그라운드' 실적 견인
- '80분의 2' 김상겸이 쏘아올린 확신의 신호탄, 78년 한국 설상 더 이상 변방 아니다 [2026 밀라노]

섣불리 다가오지 않는다. 묵묵히 지켜본다. 서서히 다가온다. 그리고 ‘소울메이트’가 된다. 민용근 감독의 신작 ‘소울메이트’는 타자가 자신과 동화되는 은근한 과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 그린 영화다. 민용근 감독 역시 시나브로 쌓이는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다.
최근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민용근 감독을 만나 ‘소울메이트’ 제작 과정을 물었다. ‘소울메이트’는 첫 만남부터 서로를 알아본 두 친구 미소(김다미)와 하은(전소니) 그리고 진우(변우석)가 기쁨, 슬픔, 설렘, 그리움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한 이야기다. 중국 영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를 원작으로, 민용근 감독이 한국 정서에 맞게 각색했다.
처음 ‘소울메이트’ 제작 요청을 받았을 때 민용근 감독은 고사했다. 남성으로서, 여성의 우정을 담은 이야기를 어떻게 그려낼지 고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용근 감독은 오랜 시간을 두고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에 끌림을 느껴 결국 메가폰을 잡았다.
민용근 감독 스스로도 오랜 시간에 걸쳐 관계를 쌓는 사람이다. 아내인 배우 유다인과 만남도 먼 시간을 돌아 이뤄졌고, 지난 2021년 백년가약을 맺었다.
“아내와는 ‘혜화,동’을 찍으면서 만났어요. 그때가 2009년정도 였거든요. 그러고선 ‘소울메이트’ 시나리오를 쓸 때 쯤 가까워졌어요. 저희도 12년 정도 세월을 돌고 돌아서 만나는 이 영화와 비슷한 일이 생긴거죠. 일년에 한번 정도 안부를 묻는 사이였는데 (아내와는) 여러 가지로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배우 캐스팅 과정도 그랬다. 주연 배우로 김다미를 선택했지만 당장 역할을 맡기지 않고 대화부터 나눴다. 민용근 감독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겪었다. 저도 김다미를. 김다미는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소니도 마찬가지였다. 김용근 감독은 “영화에 잘 맞을 것 같은 눈빛이 있었다”며 그를 마음속에 뒀다. 하지만 실제로 처음 전소니를 만났을 때는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한다. 이후 지인의 병문안을 갔을 때도 전소니를 우연히 만났지만, 캐스팅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커피만 마셨다고 한다. 결국 나중에서야 정식 제안을 했다. 여기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민용근 감독은 변우석에 대해서는 “선하고 자기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캐릭터가 필요했다”며 “변우석은 시대를 타지 않는 고전적인 느낌의 아름다움을 지녔다. 그래서 진우 역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수십년에 걸쳐 쌓이는 관계의 미묘함을 민용근 감독은 ‘극사실주의 그림’으로 영화에 녹였다. 원작과 가장 다른 설정 중 하나다. 미소와 하은은 그림이라는 소재를 통해 다른 점을 발견하고 서로를 비춰보기도 한다. 민용근 감독은 “미소와 하은은 오랜 시간 끈기있게, 정확하게 서로를 바라본 사이”라며 “극사실주의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극사실주의 그림은 작가가 자기 감정을 그림 안에 넣지 않고 똑같이 그리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결과물 안에서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의 작품을 그리기까지 수개월에서 일년까지도 걸리는데 그 과정 자체가 예술작품 같더라고요. 그리는 대상과 교감하면서 그리는 거죠. 미소가 하은을 바라볼 때, 하은이 미소를 바라볼 때도 이런 극사실주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용근 감독도 영화 속에서 클로즈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두 인물의 감정을 담았다. 극사실주의 그림이 인물의 큰 얼굴에 집중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는 “클로즈업을 잘못 쓰면 표정을 조금만 표현적으로 해도 너무 직접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며 “무표정 속에서 배어나오는 감정이 보이는 모습을 쓰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민용근 감독은 원작보다 미소와 하은 두 여성의 관계에 집중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조용하고 은근하지만 그래서 힘이 센 관계가 있다. 오랜 세월동안 조용히 정확하게 바라봐주는 게 관계의 핵심”이라며 “미소와 하은의 관계의 핵심이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원작과는 달리 진우와의 삼각관계 요소가 깊게 들어오지 않게 했다는 게 민용근 감독의 말이다.
또 민용근 감독은 “플랫폼이 많아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상 콘텐츠가 지닌 이미지와 사운드의 본질이 희석되는 느낌이라고 한다”며 “영화 속 스토리는 극히 일부다. 영화는 이미지와 사운드를 가진 매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소비 행태가 변하니 산업도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지만 이미지와 사운드에 집중한 ‘영화적인 영화’가 그런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어쩌면 그래서 ‘소울메이트’는 이미지와 사운드가 정서를 전하는, 그런 영화적인 영화가 됐다.
‘소울메이트’는 오는 15일 개봉한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이찬진 "빗썸 사태, 거래소 취약점 드러나…오지급 코인은 반환해야"[일문일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901072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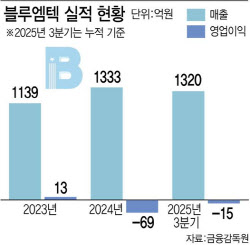








![[포토] 인사말 하는 에이티즈 종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60.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에이티즈 민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61.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에이티즈 홍중](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59.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에이티즈 우영](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58.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산, 그렇게 쳐다보면 형 또 설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57.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에이티즈 여상](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56.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에이티즈 윤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55.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에이티즈 성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54.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종호, 쌍 엄지척](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48.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종호, 곰돌이의 손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46.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종호, '명창 하리보'의 당당함](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47.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우영, 프린스의 맥박 짚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44.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