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올림픽은 JTBC ‘단독’ 중계 확정→북중미 월드컵은? “열린 자세로 협상 중” [IS 현장]
- '방출 2회' 클레멘테의 인생 역전, WBC 미국 대표팀 발탁
- "원하는 결과 만들고 싶다" 남자 핸드볼, 제22회 아시아남자선수권대회 출국
- "30홈런 목표 달성하고 싶다" 준PO 3G 연속 홈런 괴력의 고명준, 다시 뛴다 [IS 인터뷰]
- 홈플러스 "점포 7곳 추가 영업중단…1월 급여 지급도 연기"
- [IS하이컷] 소유진, ♥백종원과 대기실서 투샷…”그리고 나”
- 소유진, ♥백종원과 여전한 금슬…시밀러룩까지 [AI 포토컷]
- 조정석♥거미, 오늘(14일) 둘째 득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 [공식]
- SK매직, 신년 구독 이벤트 진행…최대 50% 할인
- [영상] '예스맨' 기보배-김남일-박태환 등 , ‘레전드 총출동’…스포츠 레전드들의 예능 도전기
연예일반
[자음추] 괴로워도 ‘타인의 고통’과 마주할 용기… ‘올빼미’와 김윤아
등록2022.11.23 12:57


소현세자가 왕이 됐다면 어땠을까. 조선시대 역사를 훑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하게 되는 생각이다.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가 8년여를 보내고 돌아온 고국. 부친의 냉대 속에 학질(기록에 따르면)로 쓸쓸히 세상을 떠난 비운의 세자.
‘올빼미’는 소현세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배경으로 한 사극 스릴러다. 낮에는 앞을 볼 수 없고 빛이 없을 때만 조금 앞이 보이는 주맹증을 앓고 있는 침술사 경수가 소현세자의 죽음을 목도한 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라는 소재는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 선명하게 맞닿아 있다.


118분여의 ‘올빼미’를 보며 지난 2016년 발매됐던 김윤아의 앨범 ‘타인의 고통’이 떠올랐다. 평소 SNS를 떠돌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본다던 김윤아는 “SNS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들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다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올빼미’의 결말을 누군가는 해피엔딩으로, 누군가는 새드엔딩으로 볼 것이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영화가 뒤집기는 어렵고, 사실 인조와 소현세자가 걸었던 그 역사를 21세기 우리도 반복하고 있을지 모른다. 다만 영화 속 소현세자의 말처럼 진실을 보고 눈을 돌리지 않는 용기가 때로는 필요하고, 그러한 장면들은 영화를 본 관객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것이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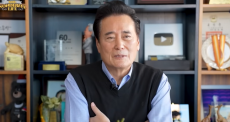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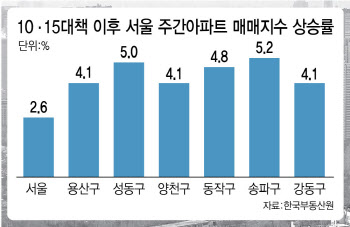

![‘역대급 1000억 기부’ 신사고 대표의 두 얼굴[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401173T.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64.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귀여운 크로스하트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63.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화끈함 자신있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62.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기대해도 좋아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61.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패널 군단들의 케미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9.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포토타임에서도 느껴지는 케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8.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재미있는 케미를 보여드릴 패널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60.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덱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4.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한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6.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덱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5.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이다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7.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규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3.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