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이호선, 박나래 품은 ‘운명전쟁49’ 하차 전말…“내가 나설 길 아냐”
- ‘슈돌’ 하루, 福들어 올 것 같은 첫돌 사진…“父심형탁 판박이”
- ‘UFC 9연승’ 예블로예프, 英 런던서 싸운다…맨체스터 출신 르론 머피와 맞대결
- 단종 부활 ‘왕사남’ 300만 돌파…손익분기점도 달성 [공식]
- ‘충주맨’ 김선태, 내부 갈등설 부인…사직 후 ‘의리 행보’ 눈길 [왓IS]
- 황영웅, 강진청자축제서 8천 관객 만난다…숙박시설·음식점 예약 ‘포화’
-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42세 엄마 선수’ 테일러의 감격스러운 우승 [2026 밀라노]
- ‘결혼 발표’ 최준희 “설날 쉽지 않네”…母 최진실 떠올리며 뭉클 [IS하이컷]
- '충격' 한국 WBC 대표팀 선수, 대만 선수에게 욕설 폭언 들었다…무슨 일?
- 아이유X변우석, 대군 부부의 설 인사…“‘몸과 마음 튼튼 한 해 되길”
경제
"고객 편하다고 네이버·카카오만 키워주나"…금융업계 '역차별' 부글부글
등록2020.08.03 07:00

최근 은행·카드 등 금융업계에서 금융당국을 향한 볼멘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금융권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들을 무조건 키워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사와 빅테크가 향후 디지털을 중심으로 펼쳐나갈 경쟁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은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 서비스에 충분한 규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기보다는 제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채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직접 경쟁에 따른 위험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때문에 발생할 위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연계·판매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제·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계좌 관리나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관련 금융규제는 제휴 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에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례로 최근 정부가 빅테크에 허용해준 30만원 한도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두고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액결제 연체가 높은 편인데, 각종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쌓은 카드사만큼 빅테크들이 관리할 수 있겠냐”며 “당국이 빅테크의 부실 등 건전성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은 내놓지 않고 키워주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빅테크에 30만원 한도로 제한적인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한 것은 당초 카드사들이 우려했던 후불결제 한도였던 ‘50만원 이상’보다는 낮지만,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소액결제 고객군을 지켜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빅테크가 할부, 현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이를 두고 카드사들은 “후불결제를 통해 사실상 신용카드 사업을 벌이게 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여신업법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카드사에는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마케팅 규제’로 인해 비슷한 상품을 출시해도 빅테크는 되지만 카드사는 허용되지 않는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동일 선상 경쟁이 힘들어졌다.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금융사들은 '역차별'이라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각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각종 금융정보를 일괄 수집해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를 추천하는 모델이다.
이달부터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금융 사업자들은 고객 동의만 얻으면 각종 금융정보(계좌정보, 대출 여부, 주소, 연령대 등)를 공유할 수 있다. 금융사는 각종 금융정보를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공유하게 되나, 빅테크들은 일부만 개방하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 데이터 등은 공유하지만 ‘네이버’에 쌓인 정보들까지 개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균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빅테크의 금융 자회사 입장에서는 금융사와 모회사의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금융사는 정보를 떠먹여 주기만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에 기회를 열어주는 이유는 금융 소비자들이 편하기 때문이다”며 “뱅크샐러드와 같은 스타트업 핀테크들에 일단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빅테크는 다르지 않으냐. 결국 핀테크들도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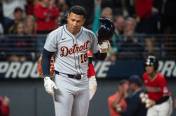





![[포토] 티파니 영, 미소에 홀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5.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이찬원, 한터뮤직어워즈 MC 맡았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7.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우아함 종결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4.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아름다운 드레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2.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사뿐사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6.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공주님 들어가십니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3.400x280.0.jpg)
![[포토] 이찬원, 팬분들 사랑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0.400x280.0.jpg)
![[포토] 이찬원, 멋진 슈트핏](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1.400x280.0.jpg)
![[포토] 이찬원, 여유로운 MC의 입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9.400x280.0.jpg)
![[포토] 윤종신, 18년 만에 내는 정규앨범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7.400x280.0.jpg)
![[포토] 윤종신, 인자한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8.400x280.0.jpg)
![[포토] 이창섭, 감기투혼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5.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