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전완근 강타' 문동주, 검진 결과 '이상무'
- 결승타+호수비...3연패 탈출 지원한 김민혁 "통증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IS 스타]
- 127일 만에 3승 노렸던 정현우, 구원 투수 BS에 무산...QS 투구는 고무적 [IS 스타]
- ‘이란 갈래’ 이적 파동 아사니, 이정효 선택받았다…논란 딛고 대전전 선발 출격 [IS 광주]
- ‘SON 후임’ 로메로, 토트넘과 재계약 가능성…“매우 헌신적인 선수”
- ‘국민 남동생’ 여진구, 데뷔 20주년 아시아 팬미팅 개최
- [포토]키움, kt전 스윕 실패 3연승 마침표
- [포토]선수들 맞이하는 이강철 감독
- 토니모리, 2분기 영업익 56억원, 전분기 대비 52.9% 증가
- [포토]kt위즈, 키움에 5대 3 역전승 연패 탈출에 성공
야구
[김인식 클래식] 두산, 정상 문턱에서 넘어진 몇 가지 이유
등록2018.11.28 06:00

2018 한국시리즈 6차전 패배 후 두산 베어스 선수들의 모습
두산이 한국시리즈(KS) 우승 트로피를 되찾는 데 실패했다. KS가 종료된 지 보름여가 지났지만 정규 시즌 우승팀으로서 정상에 서는 데 실패한 만큼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두산은 2015~2016년 두 시즌 연속으로 KS 우승 트로피를 차지, 그해 명실상부한 최강팀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2017년과 2018년에는 정상 문턱에서 좌절했다.
지난 2017년 두산의 3연속 KS 우승 달성 실패는 팀의 핵심 선수인 양의지와 김재호의 부상 여파가 컸다. 특히 KS에서 극심한 부상으로 제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했다. 양의지는 타율 0.125(16타수 2안타), 김재호는 타율 0.167(24타수 4안타)에 그쳤다. 두 선수에게 결정적 찬스가 향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 이유는 결국 부상 여파가 아닌가 싶다. 이에 박세혁·류지혁 등 백업 선수들이 많은 부담감을 안았다.

2017년에는 2위로 한국시리즈까지 올라왔으나, KIA에 우승을 내줘야했다.
2017년에는 정규 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PO)를 거쳐 KS에 올라 KIA에 1승4패로 무너졌다면, 올해는 정규 시즌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하고도 마지막에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정규 시즌은 그야말로 두산의 독무대였다. 역대 팀 최고 타율에 93승51패(승률 0.646)로 여유 있게 조기에 우승을 확정했다. 2위 SK와 승차가 무려 14.5게임에 달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두산이 마운드에서 SK에 열세를 나타냈다. 원투펀치 조쉬 린드블럼과 세스 후랭코프를 제외하면 제대로 선발진이 갖춰지지 않았다. 정규 시즌 15승3패를 올린 이용찬도 기대에 못 미쳤다. 여기에 장원준은 정규 시즌에 이어 KS에서 부진했고, 김강률도 KS 준비 기간에 부상으로 이탈했다. 이용찬과 장원준, 김강률의 활약도와 공백이 아쉬웠다. 좋은 기량을 펼친 국내 투수는 결국 마무리와 계투진인 함덕주, 박치국 둘밖에 없었다. 두산은 KS 평균자책점이 3.38, SK는 그보다 낮은 2.68이었다. 선발과 중간 모두, 마운드에서 두산이 완전한 열세였다. 상대 마운드가 좋은 컨디션을 자랑했다는 의미는 곧 두산 타선이 기대 밖으로 저조했다는 뜻이다.
또 단기전은 분위기 싸움이 중요하다. 최고 멤버 속에 최고 성적을 올렸어도 단기전은 또 다른 양상, 다른 결과를 낳곤 한다. 전력상 밀리는 팀이 충분히 업셋을 달성할 수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를 봐도 마찬가지다.
SK는 넥센과 치열한 PO 승부 끝에 승리해 기분 좋게 KS에 올라서인지 제대로 분위기를 탔다. KS 우승까지는 팀 분위기와 보이지 않는 운도 작용해야 한다. 또 생각지도 못한 선수의 활약이 동반돼야 한다. SK는 이 같은 다양한 효과가 어우러졌고, 두산은 여기서 밀렸다.

팀의 4번 타자로 20년 만에 잠실 홈런왕에 오른 김재환이 옆구리 부상 탓에 KS 3차전 이후 결장하면서 타선의 힘이 크게 떨어졌다.
시즌 종료 이후 두산의 코칭스태프 이동도 마이너스 요소로 보인다. 포스트시즌 기간 중 이강철 수석 코치의 kt 감독으로 이동 발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KS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태균 1루코치(→kt) 공필성 3루코치(→롯데)의 작별이 알려졌다. 두산은 KS가 끝나고 이틀 뒤에 김원형·김민재·고영민·이도형 코치의 영입을 발표했다. 이는 KS 종료 이전에 코치 이적 및 영입이 확정됐음을 보여 준다. 팀워크를 깨는 요소다.
두산은 최근 이영하·곽빈·박치국 등 젊은 마운드 자원이 성장했지만 막상 KS 뚜껑을 열어 보니 마운드가 예전에 비해 많이 비어 있는 느낌이었다. 여태껏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올 시즌 부진했던 장원준과 유희관·이현승을 대신할 수 있는 젊은 투수들의 성장이 필요하다.
김인식 전 국가대표 감독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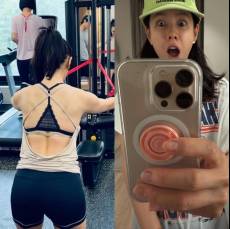



![[단독]非육사 출신 원스타에 방첩사령부 개혁 맡긴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8/PS25081700345B.jpg)











![[포토]키움, kt전 스윕 실패 3연승 마침표](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7/isp20250817000196.400x280.0.jpg)
![[포토]선수들 맞이하는 이강철 감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7/isp20250817000194.400x280.0.jpg)
![[포토]kt위즈, 키움에 5대 3 역전승 연패 탈출에 성공](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7/isp20250817000193.400x280.0.jpg)
![[포토]소형준 첫 세이브, kt 키움 꺾고 연패탈출 성공](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7/isp20250817000192.400x280.0.jpg)
![[포토]소형준, 연패 탈출은 내가 마무리한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7/isp20250817000190.400x280.0.jpg)
![[포토]소형준, 연장 10회 등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7/isp20250817000189.400x280.0.jpg)
![[포토]적시타 강백호, 한 점 더 달아나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7/isp20250817000186.400x280.0.jpg)
![[포토]윤석원, 이럴수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7/isp20250817000185.400x280.0.jpg)
![[포토]연장 적시타 김민혁, 내가 승리 쏜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7/isp20250817000184.400x280.0.jpg)
![[포토]김민혁, 연장전 균형을 깨는 1타점 적시 2루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7/isp20250817000183.400x280.0.jpg)
![[포토]김민혁, 카디네스 장타 지우는 호수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7/isp20250817000171.400x280.0.jpg)
![[포토]역투하는 이상동](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7/isp20250817000170.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