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쇼트프로그램 돌아본 차준환 “점수 아쉽지만, 그 순간은 가져갔다” [2026 밀라노]
- KT 3명이나 뽑혔다, WBC 투수 삼총사의 의기투합 "꼭 잘 던지겠다"
- 민희진, 255억 풋옵션 승소 후 ‘토끼 5마리’…뉴진스 암시하나
- SSG 최정의 3루수 백업이 고명준? "아직은 적응 중, 앞으로 야구 인생에 더 도움"
- 구멍 뚫린 수비, 역대 최저 승률까지 거론되는 '뒷심 부족' 신한은행 [IS 포커스]
- ‘한국 떠나 중국 택한’ 린샤오쥔이 패싱당한 이유 조명→현지 매체 “코치진 신뢰 하락, 경쟁력 부족” [2026 밀라노]
- "젓가락 없다고 투덜?" 한국 대표팀 향한 일본 비아냥…중국도 주목 [2026 밀라노]
- 휠체어에 실려나간 독립리그 출신 日 투수, 결국 WBC 부상 낙마...2연패 도전 일본 악재
- 지옥훈련도 그저 꿈만 같다...박찬형 "1년 전 알바 병행, 운동만 집중해 좋아"
- 부상에도 못 깎은 가치…KIA 김도영, MLB 국제 유망주 5위→야수 전체 1위
야구
프로야구 ‘산업’, 매출은 증가했지만 모기업 의존도는 여전
등록2017.05.17 06:00

지난해 프로야구는 역대 최다인 관중 871만 명을 유치했다. 포스트시즌과 올스타전을 더하면 900만 명이 넘었다. 역대 최고 호황이었다.
이에 힘입어 10개 구단 프로야구 매출도 503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2015년 대비 10.6% 가량 늘었다. 흑자 구단은 2015년 2개에서 4개가 됐고, 10개 구단 전체 당기순이익은 132억원이었다. 2015년엔 당기순순실이 51억원이었다. 하지만 표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단의 자생력은 여전히 취약했다. 일간스포츠는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와 구단 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10개 구단 경영 상태를 점검했다.
10개 구단 중 넥센이 가장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매출액 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52.3% 증가라는 엄청난 실적을 이뤘다. 당기순이익은 무려 190억원으로 이전 4년 간 손실(175억원)을 벌충하고도 남았다.
매출과 이익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선수 육성’이었다. 2016년 회계연도에 강정호(피츠버그)와 박병호(미네소타)의 포스팅 수입이 함께 집계됐다. 두 선수의 포스팅 수입금은 1785만2015달러로 약 200억원이다. 프로야구는 프로축구에 비해 해외 이적이 활발하지 않지만, 우수 선수의 육성이 구단 재정을 단시간에 호전시킨 사례다.
2016년엔 고척스카이돔(넥센)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삼성)가 개장해 프로야구팬들을 맞았다. 보다 많은 좌석과 편의성을 갖춘 새 구장은 더 많은 매출을 가능케 했다. 넥센의 입장수입은 전년 대비 62% 늘었고, 광고수입도 ‘국내 최초 돔구장’ 프리미엄에 힘입어 44% 늘었다. 두 부문에서 매출 증가액은 96억원이었다. 삼성도 입장 수입이 68억원에서 90억원으로 늘었고, 2015년까지 잡히지 않았던 신축구장수입 47억원이 발생했다. 입장수입 증가분과 신축구장수입을 더하면 69억원이다. 삼성의 총매출액은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706억원에 당기순이익 16억원이었다.

한국시리즈 우승팀 두산은 지난해 2015년 대비 매출액이 100억원 늘었다. 넥센(215억원), 삼성(125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와일드카드 결정전 상대였던 LG와 KIA도 각각 매출액이 7.7%, 3.4% 늘었다. LG의 총매출액은 502억원이지만 농구(세이커스) 부문을 제외하면 460억원 대다.
SK는 2015년보다 1억원 많은 429억 매출을 기록했지만 당기순손실이 11억원에서 28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NC는 매출이 7억원 줄었지만 32억원 적자에서 23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kt와 한화는 매출 감소가 각각 –6.4%, -4.3%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하지만 프로야구단의 경영 상태는 매출액과 손익으로만 파악하기 어렵다. 야구단 매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항목은 광고수입, 다음이 입장수입이다. 지난해 최다 관중(116만5020명)을 유치한 두산도 입장 수입(135억원)의 비중은 총매출의 26%에 불과했다. 반면 광고 매출은 구단 별로 50~60%대에 이른다. 이 광고 매출은 대체로 모기업 계열사에서 발생한다.

총매출에서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매출을 제외한 금액을 ‘구단자체매출’로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구단 8개 구단의 자체매출비율은 56.1%에 불과했다. 삼성과 한화는 30%대였다. 모기업이 없는 넥센을 제외하면 비율은 48.2%로 떨어진다. 2015년(44.9%)와 큰 차이가 없다. 결국 매출의 절반 이상을 모기업에 의존하는 구조다. 자문에 응한 회계전문가 A씨는 “이 수치로는 KBO 리그 구단은 자생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했다.
물론 모기업에서 발생하는 매출 역시 구장이나 유니폼, 헬멧 등 광고권 판매 대가다. 하지만 대체로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다. 수도권 A구단 관계자는 “우리 구단은 광고대행사에 맡겨 시장 가격대로 광고비가 책정된다. 하지만 다른 구단들은 모기업이 ‘우호적’인 가격을 매긴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내 프로야구단은 주요 대기업집단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장 큰 광고주다. 수도권 B구단 관계자는 “삼성 구단에서 LG 광고, kt 구단이 SK 광고를 유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프로야구단 경영 환경은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졌다. 2014년 이후 3개 구장이 신축됐고, 1개 구장이 신축 예정이다. 기존 구장들도 리모델링됐고, 구장 임대 조건도 점차 향상돼 왔다. 하지만 아직 ‘자생력 있는 프로야구단’이 나오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한 지방 구단 대표는 “프로야구단 1년 수입은 성적에 따라 다소 변수가 있지만 사실 예상이 뻔하다. 지금의 모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지출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민규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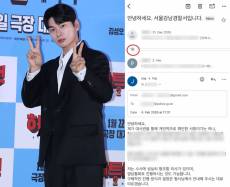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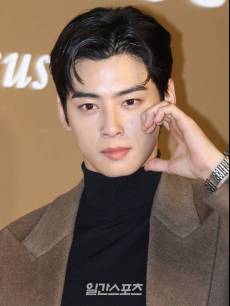



![금융당국, 빗썸 ‘유령 코인’ 사실상 방치…“감독·제도 공백”[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2223T.jpg)










![[포토] 아묻따밴드 조정민, 사랑스러운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2/isp20260212000340.400x280.0.jpg)
![[포토] 아묻따밴드 조정민, 단아한 손가락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2/isp20260212000339.400x280.0.jpg)
![[포토] 아묻따밴드 조정민, 밴드의 홍일점 맡았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2/isp20260212000338.400x280.0.jpg)
![[포토] 아묻따밴드 김준현, 드럼 맡았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2/isp20260212000336.400x280.0.jpg)
![[포토] 아묻따밴드 김준현, 볼빵빵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2/isp20260212000341.400x280.0.jpg)
![[포토] 아묻따밴드 김준현, 우리 밴드 짱](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2/isp20260212000337.400x280.0.jpg)
![[포토] 아묻따밴드 전인혁, 가족들에게 하트 날릴게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2/isp20260212000335.400x280.0.jpg)
![[포토] 아묻따밴드 전인혁, 밴드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2/isp20260212000333.400x280.0.jpg)
![[포토] 아묻따밴드 차태현,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2/isp20260212000332.400x280.0.jpg)
![[포토] 아묻따밴드 차태현, 귀여운 곰돌이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2/isp20260212000331.400x280.0.jpg)
![[포토] 아묻따밴드 차태현, 앙증맞은 손가락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2/isp20260212000329.400x280.0.jpg)
![[포토] 아묻따밴드 조영수, 건반 맡았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2/isp20260212000328.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