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브브걸 은지 “‘롤린’ 역주행에 운 다 쓴 듯” (‘귀묘한 이야기2’)
- 임시완 “프로 방문러 된 후 밥 먹자는 횟수 확실 줄어” (‘살롱드립’)
- 임시완 “사이코패스 연기, 일상에도 영향” (‘살롱드립’)
- 임시완 “음반 활동시 더블랙레이블-SM 매니저 두 명 다 나와” (‘살롱드립’)
- 어도어, 민희진 용산구 아파트 상대 5억 가압류…법원 인용 [왓IS]
- [IS하이컷] 남규리, 변치 않는 인형 비주얼…”겨울 내내”
- 올림픽 앞둔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선·이나현, 동계체전서 2관왕
- LGU+, 대학생 앰배서더 '유쓰피릿' 17기 모집
- '다음은 체임벌린?' 2만8596점 오닐 넘어선 하든, NBA 역대 득점 9위 등극
- 남규리, 리즈 갱신… 인형보다 인형 같은 비주얼 [AI 포토컷]
야구
[2017 프로야구에 묻는다③]왜 성공과 실패는 감독의 몫이 돼야 하나?
등록2017.01.18 06:00

‘경기인 출신 단장’은 프로야구에 새 트렌드가 되고 있다.
2016년 시즌 뒤 한화가 프로야구 초대 신인왕인 박종훈 전 LG 감독을 단장으로 선임한 게 신호탄이었다. 이어 LG가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 송구홍 운영총괄을 백순길 단장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새해들어 넥센이 고형욱 스카우트팀장을 새 단장으로 임명했고, 17일엔 SK가 염경엽 전 넥센 감독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연말 전격 사임한 민경삼 전 단장의 후임으로 다시 경기인 출신을 뽑았다. 넥센의 장정석 신임 감독도 원래 구상으론 올해 단장을 맡기로 돼 있었다.
기존 두산 김태룡 단장과 함께 10개 구단 중 절반이 경기인 출신 단장을 선택했다. 1982~2010년에 아마추어 포함 선수 출신 단장이 다섯 명밖에 배출되지 않은 점과 대조된다.
긍정적인 변화다. 메이저리그엔 전통적으로 선수 출신 단장이 많았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학창 시절 운동을 경험했다. 그러나 학업과 운동이 구분된 기형적인 한국 교육은 ‘프로야구단’에서도 ‘선출’과 ‘비선출’ 직원을 구분케 했다. 선수 출신은 고위직에 오르기 어려웠다. 여기에서 이른바 ‘현장과 프런트의 갈등’ 문제가 생긴다. 업무적인 충돌이야 어떤 조직에서든 있는 일이지만 문화적·정서적 이질성까지 개입했다.
물론 구단이라는 조직에서 ‘선수 출신’이 늘 밀린 것만은 아니었다. 초창기 프로야구에서 감독은 구단 사장과 동급이었다. 지금은 자신도 쑥스러워하는 옛일이지만 허구연 KBO 야구발전위원장은 1986년 청보 핀토스 감독 시절 김정우 구단주에게 “감독이 높은지, 사장이 높은지 정해 달라”고 청하기도 했다. 원년부터 프런트 파워가 강했던 삼성이 2000년 김응용 감독을 영입하며 ‘프런트는 현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방침을 정한 건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야구단에서 감독의 파워는 줄어들었다. 구단주와 친분이 있는 노장 감독들은 서서히 퇴장했다. 비유하자면 과거 감독은 사장급, 지금은 이사급이나 수석부장급이다. 구단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감독의 권한은 줄어들었지만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여전히 감독의 몫이다. 성적이 나쁜 감독이 해고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기는 팀'을 만드는 역할도 감독, 혹은 넓은 범위에서 경기인 출신에게 맡긴다. 전문가를 고용한 뒤 '절반의 신뢰' 아래 관리·감독하는 게 지금까지 한국 프로야구 프런트의 주된 업무였는지도 모른다. '한 지붕 두 가족'이다.

프로야구단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어진 제약 아래에서 이기는 팀을 만드는 것이다. 메이저리그에선 팀 구성을 위한 업무는 단장이, 구성이 된 선수 지휘는 감독이 맡는다. KBO 리그 구단에선 이 부분이 불분명했다. "감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사장이나 단장의 18번 멘트는 "나는 하는 일이 없다"의 다른 표현이 아니었을까. 극적인 사례가 감독에게 구단 운영의 전권을 줬다 다시 회수하며 실패를 인정한 지난 2년 동안의 한화 이글스다.
이른바 세이버메트릭스에 관심을 가지는 구단이 많다. 세이버메트릭스는 2할8푼 타자를 3할 타자로, 7승 투수를 15승 투수로 만드는 마법이 아니다. 야구를 해석하는 여러 수단을 제공해 구단 운영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것이다. 프런트가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쓸모가 많지 않다. 최근 프로야구단을 퇴직한 한 간부는 "프런트 생활을 하면서 대외적인 목표와 대내적인 목표가 다르다는 걸 절감했다. 목표가 모호한 조직에서 인재들이 클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단장이라는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경기인 출신 단장의 증가는 썩 좋은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박종훈 한화 단장은 3년 계약을 했다. 임기 안에 성과를 내라는 의미다. 경기인 출신 단장이 많아질수록 '성과 주의'에 대한 압박은 커질 것이다.
하지만 프로야구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기는 팀'을 만드는 데 있어 프런트의 역할이 커지면 조직 전체와 부문의 목표가 구체화된다. 각 부문의 전문성이 커지면서 잘 통합된다면 강한 조직이 만들어진다. 강한 프로야구단은 강한 프로야구 리그를 만든다.
최민규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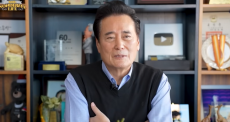







![정부 요구 자료 70~80%만 낸 쿠팡…핵심 포렌식 ‘원본’은 공백[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301252T.jpg)









![[포토] 롱샷 데뷔 쇼케이스 현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21.400x280.0.jpg)
![[포토] 롱샷 프로듀서 박재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19.400x280.0.jpg)
![[포토] 롱샷 프로듀서 박재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20.400x280.0.jpg)
![[포토] 롱샷, 신나는 무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15.400x280.0.jpg)
![[포토] 롱샷 우진, 그루브 넘치는 춤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11.400x280.0.jpg)
![[포토] 롱샷, 눈빛에 치인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12.400x280.0.jpg)
![[포토] 롱샷 률, 내가 바로 상남자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14.400x280.0.jpg)
![[포토] 롱샷 오율, 치명적인 표정](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09.400x280.0.jpg)
![[포토] 롱샷, 칼군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13.400x280.0.jpg)
![[포토] 롱샷 오율, 무대를 즐겨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08.400x280.0.jpg)
![[포토] 롱샷, 파워풀한 안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07.400x280.0.jpg)
![[포토] 롱샷 우진, 멋진 래핑](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3/isp20260113000205.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