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2이닝 연속 무사 2루→3연속 범타...'2G 연속 무득점 패전' 롯데, 이번엔 심각하다 [IS 냉탕]
- 812 이글스 대축제...김경문 감독부터 외친 '팀 퍼스트' [IS 포커스]
- 표정 관리 못한 빅리그 191G 투수...공격보다 심각했던 롯데 수비 [IS 냉탕]
- 555경기 연속 출장 '철인' 박해민에게 반가운 비..."출전할 수 있다"
- [TVis] 천정명 “고현정, 핸드폰 없애…한동안 팩스로 연락” (라스)
- 경기 중 '눈물'까지 흘렸던 2025시즌, 그래서 더 안타까운 '다사다난' 윤영철의 수술 [IS 이슈]
- ‘한의사♥’ 장영란, 혼수백 공개 “300→1800만원, 샤테크 성공” (A급 장영란)
- [TVis] 천정명 “악마 조교로 안티팬…A4 가득 채운 욕에 충격” (라스)
- [TVis] 최홍만 “엘베에서 만난 한예슬, 갑자기 소리쳐” (라스)
- ‘SBS 8뉴스 하차’ 김현우, ♥이여진·아들과 미국으로 떠났다
연예
[차길진의 갓모닝] 66. 엔지니어의 시대
등록2012.02.13 11:30
최근 신문기사엔 한 벤처 사장이 미국 시장을 뚫은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경험이 보도됐다. 그는 미국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로 '세일즈 대신 엔지니어 명함을 만들라'고 충고했다. 바이어의 기술적 질문에 솔루션을 내지 못하면 끝장이라는 것이었다. 미국의 성장 엔진이자 신흥거부들도 넓은 의미로 엔지니어 출신이다. MS의 빌게이츠·애플의 스티브 잡스·페이스 북의 마크 주커버그 등.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국가의 '성장엔진'에 대해 자주 얘기한다. 안타깝게도 말로만 성장엔진이지 정작 성장엔진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의 성장 동력은 특정 기술, 상품이 아니다. 인재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엔지니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오래 전부터 만성 이공계기피현상에 신음하고 있다. 머리가 좋은 수재들도 이공계 진학대신 법조계와 의료계를 꿈꾼다. 결혼 배우자 순위도 그렇다. 의사·판검사·공무원 등 엔지니어를 희망하는 미혼남녀는 별로 없다.
이공계를 기피하는 한국엔 분명 문제가 있다. 조선은 임진왜란 당시 화약과 조선기술에 있어 일본을 월등히 앞서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완패했다.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였다. 조총과 화포로만 무장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선은 준비하지 않았다.
동학혁명은 조선의 마지막 기회였다. 동학혁명군은 서울로 진격하다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에 전멸 당했다. 병사의 수는 동학군이 더 많았지만 일본군의 신형무기인 기관총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갔다.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나라였다. 관료는 우대받고 기술자는 천대받았다. 아무리 기술자가 좋은 발명을 해도 공은 관료들에게 돌아갔고 기술자는 목숨만 연명하면 그만이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각성이 그만큼 부족했다. 한국에서는 엔지니어가 월급쟁이 취급당하지만, 미국에서는 프로야구 선수 같은 프리랜서 대접을 받는다. 중국은 엔지니어를 기간산업으로 생각하며 양성하고 있으며, 후진타오 주석도 엔지니어 출신이다.
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내가 생각하는 그 분의 가장 위대했던 점은 엔지니어 우대였다. 일체의 탁상공론을 배제하고 현장에서 기술적용을 최우선으로 했다. 고속도로·제철소·녹화사업 등 경우에 따라서는 초법적으로 엔지니어에게 권한을 주고 마음껏 능력발휘를 하게 했다. 경제발전은 정책보다 엔지니어 우대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 대권 주자로 꼽히는 모 교수가 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그가 정치에 뜻이 있건 없건 사회적으로 많은 층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그 현상의 중심에는 그가 신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엔지니어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치와 엔지니어는 궁합이 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료풍의 정치인들에게 신물이 난 유권자들이 관료와는 다른 엔지니어 출신인 모 교수에게 매료됐다.
벤처기업의 핵심은 엔지니어 우대다. 엔지니어를 육성하지 않는 벤처 열풍은 거름도 주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격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운은 엔지니어를 얼마나 대우하느냐에 달려있다. 엔지니어 우대야말로 차기 대권자의 첫 번째 공약이길 바란다.
(hooam.com/ 인터넷신문 whoim.kr)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국가의 '성장엔진'에 대해 자주 얘기한다. 안타깝게도 말로만 성장엔진이지 정작 성장엔진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의 성장 동력은 특정 기술, 상품이 아니다. 인재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엔지니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오래 전부터 만성 이공계기피현상에 신음하고 있다. 머리가 좋은 수재들도 이공계 진학대신 법조계와 의료계를 꿈꾼다. 결혼 배우자 순위도 그렇다. 의사·판검사·공무원 등 엔지니어를 희망하는 미혼남녀는 별로 없다.
이공계를 기피하는 한국엔 분명 문제가 있다. 조선은 임진왜란 당시 화약과 조선기술에 있어 일본을 월등히 앞서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완패했다.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였다. 조총과 화포로만 무장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선은 준비하지 않았다.
동학혁명은 조선의 마지막 기회였다. 동학혁명군은 서울로 진격하다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에 전멸 당했다. 병사의 수는 동학군이 더 많았지만 일본군의 신형무기인 기관총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갔다.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나라였다. 관료는 우대받고 기술자는 천대받았다. 아무리 기술자가 좋은 발명을 해도 공은 관료들에게 돌아갔고 기술자는 목숨만 연명하면 그만이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각성이 그만큼 부족했다. 한국에서는 엔지니어가 월급쟁이 취급당하지만, 미국에서는 프로야구 선수 같은 프리랜서 대접을 받는다. 중국은 엔지니어를 기간산업으로 생각하며 양성하고 있으며, 후진타오 주석도 엔지니어 출신이다.
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내가 생각하는 그 분의 가장 위대했던 점은 엔지니어 우대였다. 일체의 탁상공론을 배제하고 현장에서 기술적용을 최우선으로 했다. 고속도로·제철소·녹화사업 등 경우에 따라서는 초법적으로 엔지니어에게 권한을 주고 마음껏 능력발휘를 하게 했다. 경제발전은 정책보다 엔지니어 우대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 대권 주자로 꼽히는 모 교수가 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그가 정치에 뜻이 있건 없건 사회적으로 많은 층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그 현상의 중심에는 그가 신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엔지니어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치와 엔지니어는 궁합이 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료풍의 정치인들에게 신물이 난 유권자들이 관료와는 다른 엔지니어 출신인 모 교수에게 매료됐다.
벤처기업의 핵심은 엔지니어 우대다. 엔지니어를 육성하지 않는 벤처 열풍은 거름도 주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격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운은 엔지니어를 얼마나 대우하느냐에 달려있다. 엔지니어 우대야말로 차기 대권자의 첫 번째 공약이길 바란다.
(hooam.com/ 인터넷신문 whoim.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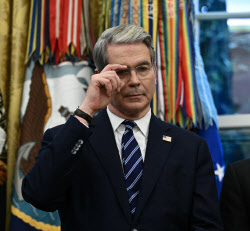









![[포토] 앳하트 아린-봄, 사이좋은 우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3/isp20250813000220.400x280.0.jpg)
![[포토] 앳하트, 멋진 엔딩](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3/isp20250813000215.400x280.0.jpg)
![[포토] 앳하트, 요정들 여기 다 모였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3/isp20250813000213.400x280.0.jpg)
![[포토] 앳하트, '플롯 트위스트' 무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3/isp20250813000214.400x280.0.jpg)
![[포토] 앳하트 아린,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카리스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3/isp20250813000212.400x280.0.jpg)
![[포토] 앳하트, 딱딱 맞는 안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3/isp20250813000211.400x280.0.jpg)
![[포토] 앳하트, 점핑](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3/isp20250813000208.400x280.0.jpg)
![[포토] 앳하트, 데뷔 같지 않은 멋진 무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3/isp20250813000209.400x280.0.jpg)
![[포토] 앳하트, 살랑살랑](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3/isp20250813000210.400x280.0.jpg)
![[포토] 앳하트, 파워풀한 무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3/isp20250813000207.400x280.0.jpg)
![[포토] 앳하트 미치-아린-케이틀린, 카리스마 눈빛](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3/isp20250813000206.400x280.0.jpg)
![[포토] 앳하트 나현, 시크한 여신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08/13/isp20250813000203.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