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0.9초의 기적’ 숨지 말라던 감독의 믿음, 코트에서 증명한 서명진 [IS 피플]
- 화사 “박정민과 ‘청룡영화상’ 무대 화제?... 그때 SNS 끊고 있었다”
- [TVis] 현주엽, 논란 이후 “하루에 정신과 약만 20알… 체중도 총 40kg 빠져”(아빠하고 나하고)
- [TVis] 아일릿 원희 “‘라스’에서 몰이 당하는 게 꿈이었다”... 현실은 긴장
- [TVis] 최현우 “유튜브 때문에 마술 비밀 다 공개돼… 위기” (라스)
- 5번째 동계 올림픽 중계 앞둔 배성재 캐스터 “내 역할은 해설위원을 돕는 거”
- [TVis] “나 꼬셔봐” 송옥순, 20살 연하 유세윤에 돌발 제안 (라스)
- [TVis] 박근형 “김구라 걱정했는데 부드러워졌다고” 폭소 (라스)
- [TVis] ‘흑백2’ 임성근 셰프 “사실 시즌3 노렸다… 제작진에 혼나” (유퀴즈)
- ‘2위 도약’ 유도훈 감독 “고비가 이렇게 크게 올 줄은…브레이크 때 연구하겠다” [IS 승장]
스포츠일반
[겨울레포츠 체험 ① 열기구] 지상 100m 바람따라 구름따라 ‘둥둥’
등록2007.11.20 13:02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엔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은 1783년 프랑스의 몽골피에 형제가 개발한 열기구를 피라디제 디 로제가 최초로 하늘에 띄우면서 현실이 되었다.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전 세계 수십 곳에서 열기구 축제가 열리는 대중적인 레저로 발전했다. 열기구를 띄우는 데 제약이 많은 우리나라는 가을 추수가 끝난 늦가을부터 초봄까지가 열기구를 탈 수 있는 시즌이다.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 전주시내 한복판. 상승기류가 일어나기 전인 이른 아침에 열기구를 띄운다. 열섬(도시의 기온이 교외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상승기류를 타게 된다면 기구가 갑자기 상승해 초보자에게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공터에 바스켓(조종사가 타는 바구니)을 엎어놓은 다음. 프로판 가스 열로 데워진 공기를 에벨로프(열기구의 풍선 부분)에 주입하기 시작한다. 이내 길이 22m. 부피 4만 6000㎥의 에벨로프가 부풀어 올라 고래등처럼 빵빵해진다. 단 1분만에 열기구는 똑바로 서서 금방 하늘로 솟아오를 듯 하다.
‘푸우~푸우~푸우~’ 풍선을 향해 불화산을 내뿜는 배너의 분출구를 몇번 열어젖히자. 열기구는 서서히 움직인다. 뜨는 듯 마는 듯. 제비가 물을 차듯 땅을 몇번 찧고 나더니 서서히 지표면에서 멀어져 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지상에서 부는 바람은 약 초속 2m. 공중에 뜬 열기구도 그만치 움직인다. 바람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구니 안에 탄 사람은 속도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륙한 지 1분 남짓 지났을까? 고도계가 벌써 100m를 가리키고 있다.
“처음 타는 사람들이 있을 땐 보통 1초에 1m 정도 올라가요. 오늘은 바람이 잦아서 속도감이 거의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시내 비행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거든요. 기구 아래 있는 사람들은 출근하느라 정신 없는데. 우리는 하늘을 날고 있잖아요” ‘엑스원레저’ 양동원(39) 씨의 설명이다.
전주 시내 100~200m 상공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과 아파트 단지 위를 유유히 비행한다. 고도는 때로 60m 근방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아파트 옥상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교복을 입은 학생. 집 앞 마당을 쓰는 아주머니.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다들 ‘아침부터 무슨 조화냐’며 고개를 들어 빤히 쳐다본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자. 마당을 쓸던 아주머니는 하늘을 향해 빗자루를 흔들어 보이며 좋아한다.
열기구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방향을 인위적으로 조종할 수 없다. 다만 고도마다 다른 바람의 방향을 찾아 열기구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유능한 열기구 조종사가 되려면 상공에서 제각각으로 부는 바람을 재빨리 파악해 열기구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121m 근방에서 바람이 바뀌네요. 아래쪽은 북동풍. 윗쪽은 남동풍이 부는군요. 남동쪽으로 가야 저기 논에 착륙할 수 있는데. 바람이 거의 미친X 수준인데요”
돌풍에 가깝다는 뜻이다. 2003년부터 200시간 이상 비행했다는 양동원 씨도 이런 바람에는 조종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바람과 고도계를 체크하며. 거의 5초 간격으로 배너에서 불을 뿜어 에벨로프를 덮혀야 하기 때문에 “열기구 조종은 보기보다 예민한 감각이 필요하다”고 한다.
유유히 1시간 정도를 날아오니 이제 전주 시내에서 7km를 날아 논밭 위까지 왔다. 종점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정거장의 버스들. 서리가 살짝 앉은 황량한 초겨울의 들판. 그 속에서도 짙푸른 녹음을 자랑하는 미나리밭이 동쪽에서 솟아오는 붉은 해를 흠뻑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콤바인이 벼를 쓰러뜨리고 지난 자리는 마치 페루 나스카의 그림처럼 형이상학적인 문양을 하고 있다. 공중에서 보면 저렇게 사물의 이면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게 신기해 뵈는가 보다. 특히 누런 들판 위로 유유히 지나는 풍선의 그림자는 정말 꿈 속을 가르는 것만 같다. 저 풍선 그림자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풍선’이라는 노래 가사가 절로 흥얼거려진다.
‘때로는 나도 그냥 하늘높이 날아가고 싶어. 잊었던 나의 꿈들과 추억을 가득 실고~’
전주=글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사진 김진오(어드반스 패러글라이딩)
[열기구 ABC]
어떻게 생겼나?
열기구는 크게 풍선 부분인 엔벨로프(envelope). 공기를 덮히는 버너. 사람이 타는 바스켓 세 부분으로 나뉜다. 연료는 주로 액체 LPG를 사용하며. 가스 1통으로 30분 정도 비행할 수 있다. 엔벨로프는 나일론에 폴리우레탄이나 실리콘을 코팅한 섬유를 사용한다. 바스켓의 무게는 4인승의 경우 가스통 3개와 사람. 바스켓 자체 무게 등을 합쳐 약 400k~500kg 정도가 적당하다. 1인승부터 수십 명을 태울 수 있는 크기 등 종류가 다양하다.
어디서 탈까?
사실 열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몇해 전 제주에 열기구 체험장이 생겼다고 야단이었지만. 이 곳은 계류비행(고정된 장소에서 고도만 높이는 비행) 전용이다. 자유비행은 익산과 아산의 초경량항공기 공역에서 자유롭게 뜰 수 있으며. 일반인이 조종사의 도움으로 열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전주와 대전에 한 곳씩 있다. 엑스원(063-224-0332. www.x-won.com)레저는 전주와 익산. 삼례를 기점으로 비행하는데 이 지역은 근처에 비행장이 없어 큰 제약없이 시내 비행도 가능하다. 2인승부터 8인승 열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보통 1시간 체험비행은 6만원(1인) 수준이다.
조종은 어떻게?
열기구 조종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바람을 잘 이해하고 가스에 대한 안전 의식만 갖추면 된다. 다만 까다로운 것은 바람을 읽는 기상학으로 오랜 비행을 통해 몸으로 익혀야만 터득할 수 있다. 열기구 조종 면허는 만 14세 이상. 20시간 이상 비행을 한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대회는 물론 국제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0여명 안팎이라고 한다. 열기구는 영국과 미국. 동유럽 등에서 많이 주로 생산되며 가격은 바스켓과 배너 에벨로프 등을 모두 포함해 2000만~5000만원 수준. 문의 열기구협회 02-711-8439
위험하지는 않을까?
바스켓에 실은 프로판 가스가 바닥이 나면? 풍선에 불이 붙는다면 어떻게 하지? 가스가 떨어져 버너에 불이 꺼지더라고 기구는 낙하산의 강하 속도와 같은 속도로 하강한다. 에벨로프에 불이 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한다. 바스켓 안에서는 조종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움직여야 한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옷과 장갑.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다.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은 1783년 프랑스의 몽골피에 형제가 개발한 열기구를 피라디제 디 로제가 최초로 하늘에 띄우면서 현실이 되었다.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전 세계 수십 곳에서 열기구 축제가 열리는 대중적인 레저로 발전했다. 열기구를 띄우는 데 제약이 많은 우리나라는 가을 추수가 끝난 늦가을부터 초봄까지가 열기구를 탈 수 있는 시즌이다.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 전주시내 한복판. 상승기류가 일어나기 전인 이른 아침에 열기구를 띄운다. 열섬(도시의 기온이 교외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상승기류를 타게 된다면 기구가 갑자기 상승해 초보자에게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공터에 바스켓(조종사가 타는 바구니)을 엎어놓은 다음. 프로판 가스 열로 데워진 공기를 에벨로프(열기구의 풍선 부분)에 주입하기 시작한다. 이내 길이 22m. 부피 4만 6000㎥의 에벨로프가 부풀어 올라 고래등처럼 빵빵해진다. 단 1분만에 열기구는 똑바로 서서 금방 하늘로 솟아오를 듯 하다.
‘푸우~푸우~푸우~’ 풍선을 향해 불화산을 내뿜는 배너의 분출구를 몇번 열어젖히자. 열기구는 서서히 움직인다. 뜨는 듯 마는 듯. 제비가 물을 차듯 땅을 몇번 찧고 나더니 서서히 지표면에서 멀어져 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지상에서 부는 바람은 약 초속 2m. 공중에 뜬 열기구도 그만치 움직인다. 바람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구니 안에 탄 사람은 속도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륙한 지 1분 남짓 지났을까? 고도계가 벌써 100m를 가리키고 있다.
“처음 타는 사람들이 있을 땐 보통 1초에 1m 정도 올라가요. 오늘은 바람이 잦아서 속도감이 거의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시내 비행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거든요. 기구 아래 있는 사람들은 출근하느라 정신 없는데. 우리는 하늘을 날고 있잖아요” ‘엑스원레저’ 양동원(39) 씨의 설명이다.
전주 시내 100~200m 상공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과 아파트 단지 위를 유유히 비행한다. 고도는 때로 60m 근방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아파트 옥상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교복을 입은 학생. 집 앞 마당을 쓰는 아주머니.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다들 ‘아침부터 무슨 조화냐’며 고개를 들어 빤히 쳐다본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자. 마당을 쓸던 아주머니는 하늘을 향해 빗자루를 흔들어 보이며 좋아한다.
열기구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방향을 인위적으로 조종할 수 없다. 다만 고도마다 다른 바람의 방향을 찾아 열기구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유능한 열기구 조종사가 되려면 상공에서 제각각으로 부는 바람을 재빨리 파악해 열기구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121m 근방에서 바람이 바뀌네요. 아래쪽은 북동풍. 윗쪽은 남동풍이 부는군요. 남동쪽으로 가야 저기 논에 착륙할 수 있는데. 바람이 거의 미친X 수준인데요”
돌풍에 가깝다는 뜻이다. 2003년부터 200시간 이상 비행했다는 양동원 씨도 이런 바람에는 조종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바람과 고도계를 체크하며. 거의 5초 간격으로 배너에서 불을 뿜어 에벨로프를 덮혀야 하기 때문에 “열기구 조종은 보기보다 예민한 감각이 필요하다”고 한다.
유유히 1시간 정도를 날아오니 이제 전주 시내에서 7km를 날아 논밭 위까지 왔다. 종점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정거장의 버스들. 서리가 살짝 앉은 황량한 초겨울의 들판. 그 속에서도 짙푸른 녹음을 자랑하는 미나리밭이 동쪽에서 솟아오는 붉은 해를 흠뻑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콤바인이 벼를 쓰러뜨리고 지난 자리는 마치 페루 나스카의 그림처럼 형이상학적인 문양을 하고 있다. 공중에서 보면 저렇게 사물의 이면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게 신기해 뵈는가 보다. 특히 누런 들판 위로 유유히 지나는 풍선의 그림자는 정말 꿈 속을 가르는 것만 같다. 저 풍선 그림자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풍선’이라는 노래 가사가 절로 흥얼거려진다.
‘때로는 나도 그냥 하늘높이 날아가고 싶어. 잊었던 나의 꿈들과 추억을 가득 실고~’
전주=글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사진 김진오(어드반스 패러글라이딩)
[열기구 ABC]
어떻게 생겼나?
열기구는 크게 풍선 부분인 엔벨로프(envelope). 공기를 덮히는 버너. 사람이 타는 바스켓 세 부분으로 나뉜다. 연료는 주로 액체 LPG를 사용하며. 가스 1통으로 30분 정도 비행할 수 있다. 엔벨로프는 나일론에 폴리우레탄이나 실리콘을 코팅한 섬유를 사용한다. 바스켓의 무게는 4인승의 경우 가스통 3개와 사람. 바스켓 자체 무게 등을 합쳐 약 400k~500kg 정도가 적당하다. 1인승부터 수십 명을 태울 수 있는 크기 등 종류가 다양하다.
어디서 탈까?
사실 열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몇해 전 제주에 열기구 체험장이 생겼다고 야단이었지만. 이 곳은 계류비행(고정된 장소에서 고도만 높이는 비행) 전용이다. 자유비행은 익산과 아산의 초경량항공기 공역에서 자유롭게 뜰 수 있으며. 일반인이 조종사의 도움으로 열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전주와 대전에 한 곳씩 있다. 엑스원(063-224-0332. www.x-won.com)레저는 전주와 익산. 삼례를 기점으로 비행하는데 이 지역은 근처에 비행장이 없어 큰 제약없이 시내 비행도 가능하다. 2인승부터 8인승 열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보통 1시간 체험비행은 6만원(1인) 수준이다.
조종은 어떻게?
열기구 조종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바람을 잘 이해하고 가스에 대한 안전 의식만 갖추면 된다. 다만 까다로운 것은 바람을 읽는 기상학으로 오랜 비행을 통해 몸으로 익혀야만 터득할 수 있다. 열기구 조종 면허는 만 14세 이상. 20시간 이상 비행을 한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대회는 물론 국제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0여명 안팎이라고 한다. 열기구는 영국과 미국. 동유럽 등에서 많이 주로 생산되며 가격은 바스켓과 배너 에벨로프 등을 모두 포함해 2000만~5000만원 수준. 문의 열기구협회 02-711-8439
위험하지는 않을까?
바스켓에 실은 프로판 가스가 바닥이 나면? 풍선에 불이 붙는다면 어떻게 하지? 가스가 떨어져 버너에 불이 꺼지더라고 기구는 낙하산의 강하 속도와 같은 속도로 하강한다. 에벨로프에 불이 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한다. 바스켓 안에서는 조종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움직여야 한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옷과 장갑.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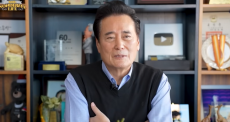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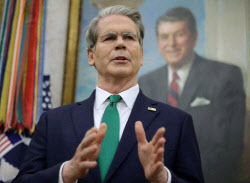

!['중복상장 논란' LS, ‘신주 인수권’ 카드 꺼냈다[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401528T.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화이팅](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64.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귀여운 크로스하트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63.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화끈함 자신있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62.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기대해도 좋아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61.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패널 군단들의 케미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9.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포토타임에서도 느껴지는 케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8.400x280.0.jpg)
![[포토] '솔로지옥 시즌5', 재미있는 케미를 보여드릴 패널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60.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덱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4.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한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6.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덱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5.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이다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7.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규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4/isp20260114000153.400x280.0.jpg)